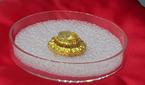[시승기]‘드림카’가 생겼다, BMW 320d 타보니
|
|
이 차를 만나본 지도 벌써 한달여가 지났다. 지난달 7일 딱 80㎞가량 타본 것이 다다. 하지만 아직도 가끔 꿈 속에 이 차가 등장한다. 그날 느꼈던 운전의 재미가 다시 떠오른다. 발바닥으로 전해지던 은근한 노면의 진동과 긴장감이 떠올라 아침이면 괜히 발가락을 꼼지락거리게 된다.
이날의 시승코스는 짧았다. 서울 창전로 BMW 마포전시장을 출발해 경기도 양주시 소재 한옥카페를 들러 돌아왔다. 거리는 100㎞에 못 미쳤고 2시간이 채 안걸렸다. 이 짧은 시간동안 뭘 느끼랴 싶었지만 기우였다.
2시간은 ‘펀 드라이빙’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기에 넘치도록 긴 시간이었다. 펀 드라이빙은 BMW 관계자가 320d의 특성에 대해 설명할 때 수없이 반복했던 용어다. 말 그대로 5감이 모두 즐거웠다.
일단 엔진 소리가 경쾌했다. 넓은 개방감에 시야도 밝아졌다. 고급 가죽시트에서 나는 새차 냄새가 좋았다. 은근한 노면진동이 손과 발, 엉덩이와 등허리에 적당한 긴장감을 불어넣어줬다. 밟으면 순간의 멈칫거림도 없이 쏘아나가는 힘에 입에는 단침이 고였다.
시속 100㎞에서 140㎞를 왔다 갔다 하며 달렸다.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번갈아 콱콱 잡아대는 데도 동승자는 잘 모르는 눈치였다. ‘좋다’ ‘최고다’ 같은 감탄사만 연발할 뿐이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서는 급커브의 연속이었다. 산을 돌아 넘어가는 시골길이 다 그렇듯 여기저기 급격하게 꺾여 있었다. 딱히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채 핸들을 돌려댔다. 차는 땅에 착 달라붙은 채 유려하게 에쓰(S)자를 그려냈다. 몸은 편안했다. 긴장한 것은 꺾인 길을 바라보는 눈동자뿐이었다.
성능에 비해 외관은 큰 특징이 없다. 전형적인 BMW다. 날렵하게 빠진 몸매며, 다소 길쭉해진 헤드램프와 테일램프 정도가 특징이라면 특징. 사실 출발 전 BMW측으로부터 이번에 새로 바뀐 디자인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받았지만 크게 와닿지는 않았다.
물론 특징이 없다는 말이 디자인이 별로라는 말은 아니다. 어찌 보면 ‘전형적인 BMW 디자인’이라는 말 자체가 최고의 찬사 아닌가. 준중형 모델답게 뒷좌석이나 트렁크 공간은 그리 넓지도, 그리 좁지도 않았다.
이날 기록한 실연비는 10.6㎞/ℓ. 공인연비(16.6㎞/ℓ)에 한참 못 미쳤다. 하지만 코스가 매우 짧았고, 그마저도 급가속과 급브레이크를 반복한 탓인 듯하다.
워낙에 3시리즈를 드림카로 꼽는 사람들이 많아 굳이 특정층을 꼽아 이 차를 추천하기는 어렵다. 가격은 부가세를 합쳐 △320d 4940만원 △320d xDrive 5340만원 △M스포츠 패키지 5390만원 △320d 이피션트 다이내믹스(ED) 4600만원이다.
다만 수입차들이 으레 그렇듯 내비게이션은 기대 이하다. 터치도 안되고 길안내도 직관적이지 못하다. 안내가 헷갈려 오가며 한번씩 두 번 길을 잃었다.
많이 본 뉴스
연예가 핫 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 이스라엘, 이란 본토 새벽 공습… 6일만에 재보복
- 이스라엘 보복에 코스피 3% 급락…환율 1390원대 급등
- 정부, 국립대 ‘의대 증원 조정’ 건의 수용할 듯…3시 발표
- 尹, 4·19묘지 참배…“자유민주주의 더욱 발전시킬 것”
- 최상목, 野 추경 요구에 “지금은 민생·약자 지원에 집중”
- 이화영 ‘검찰 술파티’ 했다는 날…檢 일지엔 ‘구치소 복귀’
- 어플로 단숨에 신분증 위조…자영업자 울리는 청소년들
- ‘뚝뚝’ 떨어지는 원화 실질 가치…OECD 중 5번째 저평가
- 이재용, 포브스 ‘韓 50대 부자’서 처음 1위 오른 이유는
- ‘경찰국 반대’ 주도한 류삼영…법원 “정직 3개월 타당”














![[飛上 대한항공] ‘3년 여정’ 끝…아시아나 화물매각 전..](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04m/18d/20240418010010459_77_50.jpg?c=2024041912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