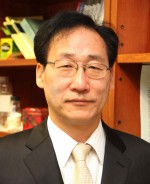 |
은행은 금융기관으로 불렸다. 수익을 추구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금융회사라는 말이 잠깐 쓰였지만 다시 금융기관이란 말이 통용되고 있다. 은행들이 실질적으로 공기업이기 때문일 것이다. 1997년 말 외환위기, 2004년 국제금융위기에 이어 최근 또다시 한국은행의 산업은행 발행 채권 인수, 한국은행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출자 등 정부는 부실채권을 쌓은 국책은행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을 기업구조조정 방안이라며 제시하고 있다.
사실 금융산업이 사업전망이 좋은 곳을 선별해 대출을 하고 사후적으로 잘못된 대출임이 드러나면 손실을 최소화하면, 성장산업이 될 수도 있다. 현실에서는 성장산업이 되기는커녕 10년 주기로 국민들의 세금을 뜯어가는 애물단지가 됐다. 이렇게 된 까닭을 추적해 가면, 국책은행뿐 아니라 모든 은행이 실질적으로 정부가 주인인 공기업이 됐다는 사실에 직면한다.
예컨대 우리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주식의 51.06%를 가진 1대주주다. KB국민은행의 경우, KB금융지주가 100%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다시 KB금융지주의 1대주주는 9.96%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공단이므로 우리은행의 경우와 별로 다르지 않다. 18개 은행 중 민간은행들 모두를 금융지주회사가 지배하고 있는데 이 금융지주회사의 최대주주는 예금보험공사나 국민연금공단이어서 사실상 정부가 주인이고 민간은행이 없다.
이런 사정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감사, 이사, 사외이사 등 이사회는 정피아, 모피아 등의 놀이터가 됐다. 낙하산 인사 시비가 끊이지 않고 은행 노조는 낙하산이라는 빌미로 출근저지투쟁을 벌여 반대급부를 챙기는 게 관행이 되다시피 했다. 금융권에서 X피아, 금밥통과 같은 말들이 오가는 작금의 상황이 우리 금융산업의 낙후성을 웅변하고 있다.
정치권이 은행의 지배구조에 대한 통제권을 틀어잡은 후, 자파 세력을 키울 정치적 도구로 삼다 보니 은행의 수익성과 경영효율성은 뒷전이 되고 말았다. 그 결과가 참담한 경쟁력이다. 새로 출범한 글로벌기업지배구조연구소 전삼현 소장은 이렇게 비판했다. "무역규모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후진적이다.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조사에서 금융시장 성숙도는 80위, 금융 건전성은 122위를 차지해 동남아 국가에도 경쟁력이 뒤진다. 은행들의 총자산이익률(ROA)이 인도네시아(2.75%), 말레이시아(1.70%)보다 낮은 0.38%에 불과하다. 이게 말이 되는가."
현재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은 동일인이 금융기관, 금융지주회사 등의 주식을 10%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초과할 때는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소위 재벌이라 불리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산업자본은 4%만 소유할 수 있으며, 설령 금융위의 승인을 받더라도 최대 10%까지만 허용된다. 이 때 4%를 초과하는 주식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 금융위가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한마디로 은행에 "주인 불허"다.
은행 주인 불허의 이유로 흔히 재벌의 사금고화 방지를 내세우지만, 공공선택론의 눈으로 보면 속셈은 다른 데 있다. 은행 이사회를 자신들의 놀이터로 유지하기 위해 통제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것이다. 물론 이는 그들의 사적 이익에 봉사하지만 국민들의 일반이익에는 반한다. 그렇게 해서는 동남아국가보다 못한 금융산업의 낙후성이 개선되기 힘들고, 국민의 부담으로 10년마다 행해지는 '구제금융'의 필요성도 온존될 것이기 때문이다.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동일인 여신한도액은 은행자기자본의 25%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동일인의 은행주식 소유한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은행에 주인이 등장하기 어렵다. 전삼현 소장의 주장처럼 이제 우리도 동일인 여신비율을 낮춰 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은행에 책임경영 주체가 등장하도록 소유지분에 대한 규제들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이런 핵심적 부분을 쏙 빼놓고 금융개혁을 논하는 것은 신발을 신은 채 발바닥을 긁는 꼴이며, "현상유지의 폭정"(tyranny of the status quo)일 뿐이다.
많이 본 뉴스
연예가 핫 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 尹 만난 홍준표 ‘김한길 총리·장제원 비서실장’ 추천
- 與, 국민의미래 ‘흡수 합당’ 절차 착수…22일 의결 예정
- 대통령 1호 거부권 ‘제2양곡법’, 野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 北, 경의선·동해선 육로 가로등 철거…“남북 합의 위반”
- ‘국민 반찬’ 김 가격 평균 10% 껑충…과자·라면값도 들썩
- ‘尹·손석희 협박 방송’ 보수 유튜버 징역 1년…법정 구속
- 한미일 재무장관 “원·엔화 평가절하 과도…긴밀히 협력”
- 스마트폰 때문?…성인 60%, 1년에 책 한권도 안 읽는다
- IMF “韓, GDP 대비 정부부채 5년 뒤엔 60% 육박할 것”
- 美 상원 군사위원장 “주한미군 감축·철수 들은 적 없어”









![[로펌 zip중탐구] 서초동 떠나 강남·여의도로…‘네트워..](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04m/17d/20240417010009625_77_50.jpg?c=202404181400?1)


![[飛上 대한항공] “세계서 가장 안전한 항공사로”…새 패..](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04m/17d/20240417010009594_77_50.jpg?c=202404181400?1)
![[단독] 마약 후 승객 태운 택시기사 ‘집유’…대중교통..](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04m/17d/20240417010009686_77_50.jpg?c=2024041814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