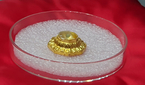|
80년대 교사들의 폭력은 거의 광기(狂氣)였다. 모두가 그랬다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강남 8학군 1세대로 기자가 지켜본 그들의 폭력은 ‘살의(殺意)’가 느껴졌고, 대부분 ‘훈육(訓育)’의 이름으로 자행됐다. 하루 수백 대씩 매를 휘두른 뒤 한 달에 한 번 칼로 손바닥의 굳은살을 파낸다는 어느 선생의 무용담이나, 칠판에서부터 학생의 따귀를 때리며 그대로 교실 한 바퀴를 돌았다는 일명 ‘싸대기 투어’ 선생의 전설이 회자된 것도 이 무렵이었다. 군사독재시대 폭력의 DNA가 고스란히 학교 사회로 전파됐고, 한 해 서울대에 몇 명을 진학시키느냐가 유일한 관심사였던 선생들은 그 스트레스를 오롯이 제자들을 때리며 푸는 듯 했다.
물론 이 시절에도 스승은 있었을 것이다. 어두운 미명(微明)에서 헤매는 제자들의 손을 애틋하게 잡아주며, 흡사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오는 키팅 선생처럼 삿된 견해만이 횡행하던 세상에서 홀로 분연히 일어나 사자후를 외치던 선생들이 왜 없었겠는가. 그러나 폭력이 대세로 먼지만 피우던 시절이라 이들의 사랑은 너절하게 가리어졌고, 결국 이 시대 대다수의 학생들은 매년 스승의 날이 찾아와도 찾아갈 스승이 없는 신세가 됐다. 마치 고등학교 졸업식날, 교련복을 찢으며 맹세했던 증오와 저주가 실현이라도 된 듯 정말로 평생 선생 볼 일이 없어졌다.
그로부터 30년 후 이제는 교권이 위태롭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욕설과 폭언은 물론 폭행까지 당하는 교사가 부지기수고, 남학생들은 여선생들을 성희롱하며 시시덕거리고 있다. 교권의 참담한 추락은 암기형 학력고사가 5지 선다형 수능으로 개조된 뒤 사교육이 극에 달했던 시점부터 시작됐다. 학교가 ‘잠자는 여관’이던 그 시절, 학교 선생들은 학원과 인터넷 강의 선생들에게 처참하게 밀리며 저질 동네 선생들로 몰락했다. 이후 교원지위법까지 개정해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제적 뒷받침이 강구됐지만 교권침해 상담건수는 한해 500건 이상으로 여전히 차고 넘친다.
일각에서는 수능 수시 확대가 교권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수능이 지금보다 더 수시 위주면 선생들이 모든 수행평가와 내신 생활기록부를 움켜쥐고 교내 권력자로 군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런 이유로 좌우를 막론하고 교원단체들은 정시 확대엔 적극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학생들을 다양하게 뽑고 싶은 일선 대학들도 견고하게 결합돼 있다. 무엇보다 ‘조국 사태’로 교육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수시에 대한 믿음이 깨졌다고 판단한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부를 찍어 누르지 않았다면 교육부 관료들도 이 ‘수시 연합’의 강력한 일원이었을 것이다.
교권 회복은 제도적 강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스승 존경’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절실하다. 물론 이 요청에는 ‘스승의 자질’이 선행돼야 한다. 부모들도 자식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한다. 세상의 모든 자식이 서울대에 갈 수는 없다. 내 자식만은 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지만 스스로 공부하는 머리와 의지는 타고나는 것이다. 부모만큼 아니 부모보다 나은 자식이 돼주길 세상의 모든 부모는 원하겠지만, 이는 결코 부모의 강요나 위법으로 이룰 수 있는 성취가 아니다. 법정의 시간을 맞고 있는 조국 부부의 자식들을 보고도 모르겠는가.
많이 본 뉴스
연예가 핫 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 정부 “내년 의대증원 인원 50~100% 안에서 자율모집 허용”
- 이스라엘, 6일만에 보복 공격…이란 “드론 3대 격추”
- ‘중동 사태’ 고조에…최상목 “범부처 비상체계 강화하라”
- 대통령실, 비선 논란에 “대변인실 입장이 대통령실 입장”
- 이화영 ‘검찰 술파티’ 했다는 날…檢 일지엔 ‘구치소 복귀’
- SK하이닉스, TSMC와 손잡고 HBM4 개발…2026년 양산
- 경찰,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사들 주거지 압수수색
- 尹, 4·19묘지 참배…“자유민주주의 더욱 발전시킬 것”
- 최상목, 野 추경 요구에 “지금은 민생·약자 지원에 집중”
- 이동관, ‘배우자 청탁 의혹’ 보도 YTN에 5억원 손배소












![[종합]이스라엘,이란 공습…6일만에 재보복](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04m/19d/20240419010010920_77_50.jpg?c=202404191540?1)

![[飛上 대한항공] ‘3년 여정’ 끝…아시아나 화물매각 전..](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04m/18d/20240418010010459_77_50.jpg?c=2024041915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