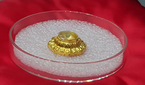|
당초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의 미 정리 채무에 국한했지만 은행 등 일반 금융회사의 채무까지 포함시키면서 숫자가 불어났다.
이 때문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지적과 함께 모럴해저드 논란이 일고 있다. ‘끝까지 버티면 또 탕감해 줄 것’이라며 빚을 갚지 않는 사람들이 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도 지출을 줄이고 줄여 꼬박꼬박 빚을 상환하고 있는 대다수 선의의 채무자들은 상대적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고통을 감내하며 어렵지만 성실하게 채무 이행을 하는 와중에 나랏돈 수조원이 빚 탕감에 사용된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이들의 심정은 어떨까.
금융당국은 신청자 대부분 몸이 아프거나 장기간 도피생활로 생계비를 제외한 여유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며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려 애쓰고 있다. 상환소득이나 처분할 재산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해명에도 적극적이다.
하지만 정부의 말대로 상환 능력을 상실해 빚을 탕감해주고 재기의 기회를 준 것이라면 오히려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장기간 유예하는 방식이 옳다. 역설적으로 빚 탕감을 많이 해줄수록 빚 탕감을 바라는 이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연체가 8년, 9년 된 채무자들은 말할 것 없고 10년에 1000만원 탕감 기준이 2000만원으로 올라가지 않으란 법 없다며 ‘버티는’ 채무자들이 나오고 있다. 선심성 땜질 처방으론 역효과를 볼 수 있다는 신중론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 금융권에는 여전히 과잉대출과 함께 허술한 대출 심사가 만연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빚을 탕감 받은 사람들이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1534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가구당 7770만원 꼴이다. 대부분의 가구가 부채를 지고 살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식담보대출 금리는 무려 5%를 육박하고 있다. 집한 채 달랑 보유한 소위 ‘하우스 푸어’가 늘면서 부채 상환의 고통은 늘어만 간다.
이런 대다수 선의의 채무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포용적 금융이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으로 국한해선 안 된다. 포용금융의 성과를 자화자찬할 시점은 더더욱 아니다.
많이 본 뉴스
연예가 핫 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 이스라엘, 이란 본토 새벽 공습… 6일만에 재보복
- 이스라엘 보복에 코스피 3% 급락…환율 1390원대 급등
- 정부, 국립대 ‘의대 증원 조정’ 건의 수용할 듯…3시 발표
- SK하이닉스, TSMC와 손잡고 HBM4 개발…2026년 양산
- 尹, 4·19묘지 참배…“자유민주주의 더욱 발전시킬 것”
- 최상목, 野 추경 요구에 “지금은 민생·약자 지원에 집중”
- 이화영 ‘검찰 술파티’ 했다는 날…檢 일지엔 ‘구치소 복귀’
- 이동관, ‘배우자 청탁 의혹’ 보도 YTN에 5억원 손배소
- 어플로 단숨에 신분증 위조…자영업자 울리는 청소년들
- ‘뚝뚝’ 떨어지는 원화 실질 가치…OECD 중 5번째 저평가













![[종합]이스라엘,이란 공습…6일만에 재보복](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04m/19d/20240419010010920_77_50.jpg?c=202404191350?1)
![[飛上 대한항공] ‘3년 여정’ 끝…아시아나 화물매각 전..](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04m/18d/20240418010010459_77_50.jpg?c=2024041913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