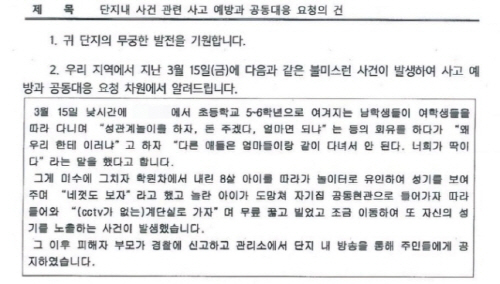[기자의 눈] “미안하다”는 단 한마디가 듣고 싶습니다
|
어떤 이들에게 1942년부터 1945년은 정말 끔찍한 악몽과 같은 시간이었다. 벗어나려 발버둥치면 칠수록 감시는 심해졌고 구타를 동반한 노동의 강도는 점차 높아졌다.
누가 봐도 심각한 ‘노동착취’에 해당하는 이 같은 비정상적인 일들은 ‘일본’의 제철소와 탄광 등지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자행됐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아들, 딸로 일본에 끌려간 이들은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가족들에게 안부 한 번 전하지 못한 채 ‘무간지옥’을 경험해야만 했다.
이들이 일본에서 겪었던 고통과 설움, 분노는 일제강점기를 벗어난 지 74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우리는 이들의 외침을 무시했고, 애써 외면했다. 자신들의 얘기를 들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야 작은 관심들이 그들에게 모이기 시작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싸움이 수차례 반복된 뒤에야 비로소 우리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있지만, 아직 성에 차지 않는다.
우리 법원은 일본 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한 행위는 당시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기에 보상을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일본 기업들이 여전히 요지부동이기 때문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모집과 알선 등에 의해 자원했기에 강제노동이라고 할 수 없고, 현재 운영 중인 기업은 전신인 당시 회사들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 배상책임이 없다는 게 일본 기업들의 주장이다. 현재 상황을 보면 기존 태도를 바꾸지 않고 법원의 명령을 최대한 늦게 이행하는 전략을 쓸 우려도 생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까지 힘을 보태, 우리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반발해 경제보복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지금의 상황을 설명할 고사성어를 검색하니 ‘적반하장’이라고 나온다. 정치·외교적인 복잡한 셈법을 떠나서 “미안합니다”라는 한 마디가 그렇게 힘든 일인지 일본 정부에 반문하고 싶다.
많이 본 뉴스
연예가 핫 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 이원석 “이화영, 사법붕괴 시도…민주당 끌려다녀선 안돼”
-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검토 반복 말고 특위 참여해달라”
- 한동훈, 총선후 첫 외출…전 비대위원 만나 “내공 쌓겠다”
- 의대교수들 ‘외래·수술 중단’ 논의···중증질환자 발 동동
- 여야, 5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 불발…주요 쟁점법안 이견
- “당선되면 끝” 꿈쩍않는 무자격 의원…국민소환제 또 부상
- “14번째 ‘줍줍’도 안 팔려”… 미분양 늪 빠진 소규모 단지
- 대통령실·민주, 1차 영수회담 준비회동…일정 추후 논의
- ‘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 2심도 ‘전원 무죄’
- 北 해킹조직 전방위 공격…방산업체 10곳 자료 빼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