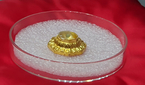|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학당’에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소크라테스, 피타고라스, 디오게네스, 유클리드, 프톨레마이오스 등 그리스인은 물론이고 이집트 여성인 히파티아와 조로아스터, 이븐 루쉬드 등 외국인을 포함한 58명의 인물들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등장한다. 인류의 보편정신이 민족과 종교의 폐쇄적 울타리를 뛰어넘어 장엄하게 교류하는 범세계적 비전이 담겨있다. 라파엘로는 아테네를 인류정신사의 영원한 이상향으로 본 것이다.
델로스 동맹의 맹주인 아테네는 민주정치와 상업경제의 꽃을 피운 개방적 문명국가였다. 반면에 그리스의 패권을 놓고 아테네와 경쟁하던 스파르타는 두 왕이 서로 협력·견제하는 2왕제와 장로회의 과두정(寡頭政)을 혼합한 독특한 정치체제 아래 군국주의로 치달린 폐쇄적 병영국가였다. 스파르타의 남자들은 일곱 살이 되면 의무적으로 병영에 들어가야 했다.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맹주인 스파르타는 나라가 곧 군대였고 시민이 곧 군인이었다. 군사력 강화에 몰두한 스파르타는 그만큼 경제적, 문화적으로 피폐했다.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후세 사람들이 스파르타의 유적을 파본다면 스파르타가 그리스 전역을 지배한 강대국이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것”이라고 썼다. 오늘날 남북한의 상황과 여러 면에서 비교되는 것이 예사롭지 않다.
마라톤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에서 연거푸 페르시아를 꺾으며 승승장구하는 아테네를 스파르타가 그대로 두고 볼 리 없었다. 마침내 두 동맹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27년간 지속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다. 아테네가 델로스 동맹국들과 번번이 집안싸움을 벌이는 동안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탄탄히 유지하는 한편 그리스의 오랜 적국이자 이민족인 페르시아의 지원까지 받았다. 동맹이냐 동족이냐? 동맹을 택한 스파르타가 승리했다. 자유와 풍요를 누리던 아테네는 월등한 군사력과 강고한 동맹으로 무장한 스파르타에 무릎 꿇고 말았다. 군사독재체제가 자유민주체제를 흡수 통일한 것이다.
승전국 스파르타는 동족인 아테네를 선의(善意)로 대하지 않았다. 스파르타는 아테네의 성벽을 모조리 허물고 아테네가 자랑하던 전함도 모두 강탈했다. 델로스 동맹의 맹주였던 아테네는 펠로폰네소스 동맹에 강제로 편입되어 스파르타를 맹주로 섬겨야 했다. 패전 후 아테네의 민주정은 군중의 집단감성에 휘둘리는 포퓰리즘의 우중(愚衆)정치로 흐르면서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걸었다.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시민 500명이 참여한 군중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죽은 뒤 플라톤은 민주정치를 철인정치, 명예정치, 과두정치보다 아래로 분류했다. 오늘의 민주시대에는 용납될 수 없는 주장이지만, 포퓰리즘이 민주정치의 풀기 어려운 숙제로 남아있는 것은 부인하지 못한다. “민중이라는 익명의 전제자(專制者)보다 더 미운 전제자는 없다.”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의 통찰이다.
세계 10대 무역국이자 한류문화의 중심인 대한민국이 70여년 세습독재의 핵무장국 북한과 일촉즉발의 대치상황 속에 있다. 문화강국이자 경제대국이었던 아테네의 흥망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포퓰리즘이 나라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지 않은가, 자유와 풍요 속에 안보의식이 흐려지지 않았는가, 북핵은 체제보장 수단일 뿐 무력통일 도구가 아니라는 분석은 확신인가 희망사항인가, 동맹의 결속보다 동족의 선의에 막연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인류의 학당으로 칭송받던 아테네의 몰락은 비관적인 교훈으로 우리를 경고한다. 그보다 더 비관적인 것은 자주파와 동맹파의 집안싸움을 또다시 보아야 하는 참담한 현실이다.
많이 본 뉴스
연예가 핫 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 尹, 이재명 대표와 통화… “다음주 용산에서 만나자”
- 정부 “내년 의대증원 인원 50~100% 내 자율모집 허용”
- 이스라엘, 6일만에 보복 공격…이란 “드론 3대 격추”
- 중동發 불안에 금융위 긴급회의 “일시적 요인에 기인”
- 대통령실, 비선 논란에 “대변인실 입장이 대통령실 입장”
- 이화영 ‘검찰 술파티’ 했다는 날…檢 일지엔 ‘구치소 복귀’
- SK하이닉스, TSMC와 손잡고 HBM4 개발…2026년 양산
- 경찰,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사들 주거지 압수수색
- 尹, 4·19묘지 참배…“자유민주주의 더욱 발전시킬 것”
- 최상목, 野 추경 요구에 “지금은 민생·약자 지원에 집중”












![[종합]이스라엘,이란 공습…6일만에 재보복](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04m/19d/20240419010010920_77_50.jpg?c=202404191700?1)

![[飛上 대한항공] ‘3년 여정’ 끝…아시아나 화물매각 전..](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04m/18d/20240418010010459_77_50.jpg?c=202404191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