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은 노, 대만과 홍콩 문제까지 미중 대립
시진핑, 바이든 취임 축전도 보내지 않는 등 소통 없어
미국과 중국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이 고작 10여일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임기 초반 보통 상대에 대한 예의상 가지는 일정 기간의 정치적 밀월인 소위 허니문도 없다는 느낌을 갖게 할 정도가 아닌가 보인다. 특히 대만에 이어 홍콩 문제에까지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 양국의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듯하다.
양국 간의 허니문이 사치라는 사실은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축전 한장 보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확실하게 보여준다. 베이징 서방 외교 소식통의 28일 전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20일 이상 지난 다음이기는 했어도 축전을 보낸 것과는 진짜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의 정상이 취임할 경우 거의 예외없이 축전을 보내왔다. 거의 전통이라고 해도 좋다. 그러나 바이든의 취임식과 관련한 입장 표명은 아무래도 당선 축전으로 대신하려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인 지난 24일 시 주석이 이례적으로 축하 서한을 보낸 것과 비교해볼 때도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기싸움에서 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는 말이 될 듯하다.
조속한 미·중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시 주석이 양제츠 외교 담당 정치국원을 미국에 파견하려 했다는 소문과 관련한 양국의 입장이 180도 다른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보인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먼저 양 정치국원의 파견을 은밀하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WSJ의 보도는 백악관의 소식통을 통해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또 양 정치국원의 방미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미국이 이 제안을 거절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
중국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이 직접 나서서 보도를 부인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 아닌가 보인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 모 대학 교수 M 씨는 “미·중 간의 신냉전에서 중국은 을의 위치에 있다고 해야 한다.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야 하는 입장이다. 양 정치국원의 파견을 제안한 것은 진실일 수 있다. 하지만 보기 좋게 거절당하지 않았나 보인다. 대외적으로 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자존심 때문에 부인했으나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대한 절박함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만과 홍콩 문제까지 양국의 현안이 되고 있는 현실 역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대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경우 지난 주말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벌어진 양국간 무력 시위가 잘 말해준다. 중국은 폭격기와 전투기, 미국은 항공모함 전단까지 동원해 기싸움을 벌인 바 있다. 여기에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 주미 대만 대표를 초청하고 중국이 반발한 것까지 더하면 대만 문제는 양국이 양보할 수 없는 최대 현안이라고 해도 좋지 않을까 보인다.
홍콩 문제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은 인권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이어갈 의지를 보이는 반면 “홍콩은 중국의 영토에 속한다. 홍콩 문제는 미국이 간섭해서는 안 되는 중국의 주권 문제”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이 홍콩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을 비롯한 28명을 바이든의 취임식 날인 지난 20일 전격 제재한 것에서 볼 때 조만간 양국의 갈등이 극에 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미·중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허니문이라는 관례가 통하지 않는다고 단언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듯하다. .
|
중국은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의 정상이 취임할 경우 거의 예외없이 축전을 보내왔다. 거의 전통이라고 해도 좋다. 그러나 바이든의 취임식과 관련한 입장 표명은 아무래도 당선 축전으로 대신하려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인 지난 24일 시 주석이 이례적으로 축하 서한을 보낸 것과 비교해볼 때도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기싸움에서 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는 말이 될 듯하다.
조속한 미·중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시 주석이 양제츠 외교 담당 정치국원을 미국에 파견하려 했다는 소문과 관련한 양국의 입장이 180도 다른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보인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먼저 양 정치국원의 파견을 은밀하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WSJ의 보도는 백악관의 소식통을 통해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또 양 정치국원의 방미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미국이 이 제안을 거절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
중국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이 직접 나서서 보도를 부인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 아닌가 보인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 모 대학 교수 M 씨는 “미·중 간의 신냉전에서 중국은 을의 위치에 있다고 해야 한다.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야 하는 입장이다. 양 정치국원의 파견을 제안한 것은 진실일 수 있다. 하지만 보기 좋게 거절당하지 않았나 보인다. 대외적으로 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자존심 때문에 부인했으나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대한 절박함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만과 홍콩 문제까지 양국의 현안이 되고 있는 현실 역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대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경우 지난 주말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벌어진 양국간 무력 시위가 잘 말해준다. 중국은 폭격기와 전투기, 미국은 항공모함 전단까지 동원해 기싸움을 벌인 바 있다. 여기에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 주미 대만 대표를 초청하고 중국이 반발한 것까지 더하면 대만 문제는 양국이 양보할 수 없는 최대 현안이라고 해도 좋지 않을까 보인다.
홍콩 문제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은 인권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이어갈 의지를 보이는 반면 “홍콩은 중국의 영토에 속한다. 홍콩 문제는 미국이 간섭해서는 안 되는 중국의 주권 문제”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이 홍콩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을 비롯한 28명을 바이든의 취임식 날인 지난 20일 전격 제재한 것에서 볼 때 조만간 양국의 갈등이 극에 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미·중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허니문이라는 관례가 통하지 않는다고 단언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듯하다. .
많이 본 뉴스
연예가 핫 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 尹, 내주 용산서 이재명과 첫 회담…협치 물꼬 트나
- 정부 “내년 의대증원 인원 50~100% 내 자율모집 허용”
- 이스라엘, 6일만에 보복 공격…이란 “드론 3대 격추”
- 한전, 한전 KDN 매각 보류…‘헐값 매각’ 논란에 제동
- 중동發 불안에 금융위 긴급회의 “일시적 요인에 기인”
- 與 낙선 후보들, 당선인들 태도 지적 “희희낙락 참담해”
- 대통령실, 비선 논란에 “대변인실 입장이 대통령실 입장”
- 이화영 ‘검찰 술파티’ 했다는 날…檢 일지엔 ‘구치소 복귀’
- SK하이닉스, TSMC와 손잡고 HBM4 개발…2026년 양산
- 경찰,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사들 주거지 압수수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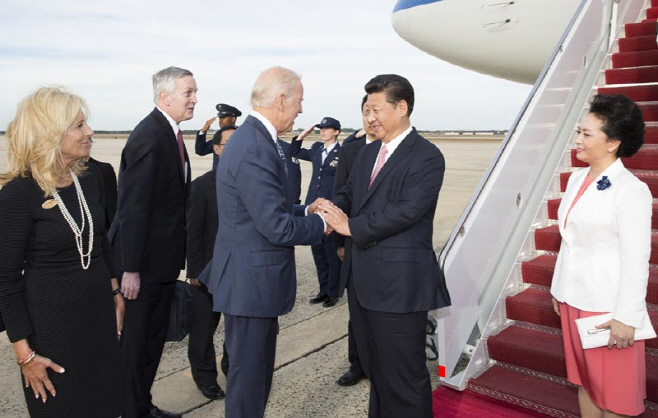





![[단독] 한전 이사회, 한전KDN 매각 보류…헐값매각 논..](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04m/19d/20240419010011110_77_50.jpg?c=202404200210?1)

![[종합 2보]이스라엘, 이란 본토 드론 공격…6일만에 재..](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04m/19d/20240419010011006_77_50.jpg?c=2024042002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