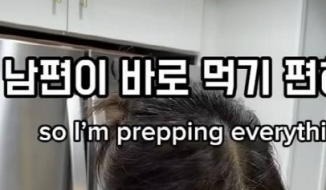|
|
|
|
이 구간은 소나무가 유난히 많아 이런 이름이 붙었다. 빽빽한 소나무 숲에서 뿜어져 나오는 솔향이 온 몸을 감싸 몸과 마음이 모두 상쾌해 진다. 또 북한산 둘레길 중 유일하게 청정한 우이동계곡을 따라 걸을 수 있다.
또 2구간은 ‘순례길’로 명명됐다. 솔밭근린공원에서 출발해 이준(李儁) 열사 묘역까지 2.3km, 1시간 10분 남짓한 짧은 코스다.
하지만 순례길은 독립유공자 묘역들이 조성돼 있는 구간으로 애국선열들의 불굴의 독립정신을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는 곳이다. 이 열사 묘를 비롯해 이시영 선생, 광복군 합동묘소 등 모두 12기의 독립유공자 묘소들이 산재해 있다.
4월 민주혁명의 주인공들이 잠든 4·19묘지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계곡쉼터와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섶다리’ 등 다른 볼거리도 있다.
내일은 마침 3·1절이다.
공휴일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즐길 게 아니라 기왕이면 트래킹을 하면서 조국 독립을 위해 한 목숨 바치신 애국지사들의 묘역들도 함께 둘러보면 어떨까. 이 1~2 구간은 상대적으로 거리도 짧고 난이도도 낮아 아이들과 같이 걸어도 무리가 없다.
2구간 이준열사 묘역부터 시작해 1구간 끝 우이동까지 걷기로 했다.
열사 묘역 입구로 가려면 지하철 4호선 수유역 1번 출구로 나와 마을버스 강북01번을 타고 통일교육원에서 내리면 된다. 통일교육원 정문 왼쪽에 순례길 입구가 보인다.
곧 왼쪽 위로 ‘일성(一醒)’ 이준 열사의 묘소가 나온다.
열사는 1907년 7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을사늑약’이 조선의 뜻이 아니라 일제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폭로하는 고종황제의 밀서를 품고 이상설, 이위종선생과 함께 떠났다.
그러나 일본, 영국의 방해로 회의 참가가 불가능해지자 원통함을 이기지 못하고 순국했다.
열사의 유해는 헤이그 ‘에이켄 두이넨 묘지’에 묻혔다가 지난 1963년에야 저승에서도 잊지 못하던 조국에 돌아와 이곳에 안장됐다. 묘역에는 헤이그에서 가져온 묘비와 석판도 있다.
조금 더 가면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의 묘가 나온다.
김병로(金炳魯) 선생은 변호사로서 독립지사나 민족운동 지도자들의 무료 변론을 도맡았다. 해방 후에는 초대 및 제2대 대법원장을 역임하신 분이다.
다음 삼거리에서 둘레길을 벗어나 왼쪽 위 이시영 선생 묘역으로 올라간다.
이시영(李始榮) 선생은 부유한 가문이면서도 전 재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이주, 독립군 양성기관인 신흥무관학교(현 경희대의 시초)를 설립한 5형제 중 한 분이다.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법무 및 재무 분야 임원으로 활약했고, 광복 후 초대 부통령이 됐으나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전횡과 친일파 등용에 반대해 사직했다.
그 묘역 바로 밑에는 광복군(光復軍) 17용사들을 합장한 묘소가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반대파였던 이 선생보다 조국 광복을 위해 전선에서 직접 싸우다 산화한 이 무명용사들이 더 반갑다.
이들 묘역에서 360m 더 올라가면, 독립운동가이자 전 국회의장인 해공 신익희 선생의 묘소가 있다. 선생도 이승만 정권의 반대파였다.
다시 둘레길로 돌아와 코스를 따라 내려간다. 곧 단주 유림(柳林) 선생 묘소가 나온다.
선생은 아나키스트이자 독립운동가로 상하이 임시정부 국무위원과 의정원 의원을 역임했으며, 해방 후에는 아나키즘 정당인 ‘독립노동당’ 당수로 활동했었다.
유림 선생 묘소 앞 계곡에는 특이한 다리가 놓여있다.
물에 강한 물푸레나무를 ‘Y자’ 형으로 거꾸로 박고 그 위에 굵은 소나무와 참나무로 골격을 만든 다음 솔가지들을 빽빽하게 가로질러놓아 상판을 만들고 그 위를 다시 흙으로 덮었다. 바로 섶다리다.
매년 추수를 마친 후 10월 하순경 마을사람들이 힘을 합쳐 만들었다가 이듬해 여름 장마로 떠내려갈 때까지 사용했다는 옛 다리다.
인근에는 김창숙, 양일동, 김도연, 서상일 선생의 묘소들이 있다.
‘심산’ 김창숙(金昌淑) 선생은 유림 출신의 독립투사로 ‘을사5적’ 처단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려 옥고를 치렀고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서 대한독립을 호소했으며, 임시정부 의정원 부의장을 지냈다. 해방 후 성균관대를 설립했으며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를 규탄하기도 했다.
‘현곡’ 양일동(梁一東) 선생은 광주학생운동을 주도했고 무정부주의 단체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해방 후 국회의원을 5차례 지내면서 신민당 원내총무, 민주통일당 대표를 지냈다.
‘상산’ 김도연(金度演) 선생은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 때 옥고를 치렀다. 해방 후 1948년 제헌의원에 당선되고 대한민국 초대 재무부장관이 됐으나 야당인 민주당에서 이승만 정권에 맞섰으며, 1965년 한일협정에 반대해 의원직을 사퇴했다.
‘동암’ 서상일(徐相日) 선생은 일제 때 항일무장투쟁 단체인 대동청년당(大東靑年黨)을 조직해 독립운동을 벌였고 만주로 망명, 투쟁을 계속했다. 해방 후에는 제헌의원에 당선됐고 혁신계 사회민주주의 정치가로 진보당·사회대중당 등에 관계하기도 했다.
진보당은 역시 독립운동가였던 조봉암 선생이 이끌다가 사형당한 그 정당이다. 김구·김규식 선생을 포함, 왜 애국지사들은 거의 다 이승만의 반대파가 됐는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이윽고 ‘강재’ 신숙(申肅) 선생 묘소가 나온다. 선생은 3·1 운동에 앞장섰고 대동단에 가입, 임시정부 설립에 관여했으며 독립군 참모장으로 활약했다.
왼쪽에 보광사가 보이고 조금 더 가면 오른쪽으로 4·19 묘지가 있다.
조국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순국선열들이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독재정권에 목숨을 걸고 맞섰던 민주열사들의 애국 혼과 정신은 서로 상통하는 것이다.
능선길을 계속 따라 내려오면 소나무숲길 구간 입구가 있고 곧 솔밭근린공원이 나타난다.
우이동 덕성여대 맞은편에 있는 솔밭근린공원은 도심 주택가이면서도 100년 된 소나무 1000여 그루가 빽빽해 솔향에 취할 정도다.
공원을 지나 골목길을 조금 오르면 동양화재중앙연수원이 있고 곧 둘레길 입구가 나온다. 만고강산 약수터를 지나니 곧 ‘의암’ 손병희(孫秉熙) 선생의 묘소에 도착한다.
선생은 ‘해월’ 최시형 선생의 뒤를 이어 동학의 제3세 교조가 됐고 동학을 천도교(天道敎)로 개명해 중흥시켰다. 1919년 3·1운동을 조직하고 민족대표 33인의 영도자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다. 이후 서대문형무소 복역 중 병보석으로 출감했다가, 1922년 5월 세상을 떠났다.
이제부턴 주택가 골목이다. 길을 조금 따라가면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호 봉황각이 있다.
봉황각(鳳凰閣)은 의암 선생이 1912년 천도교 수련을 통해 국권회복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건립한 수련도장으로 3·1운동의 거점이기도 했다.
조금 더 가니 드디어 우이동계곡이다. 우회전해 아직 얼음이 채 녹지 않은 계곡을 따라 계속 내려가면 이 구간 종점인 우이령 입구가 나온다. 여기서 120번, 153번 시내버스를 타고 지하철 수유역 3번 출구에서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