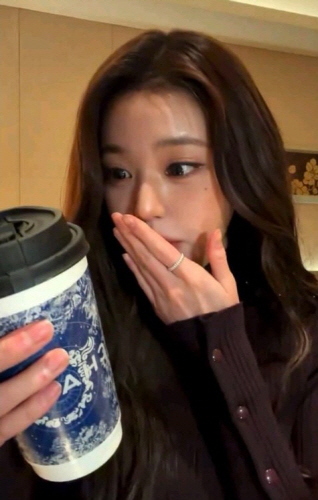기간·목표를 추상적으로 제시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내놓기도 했고, 지역주민의 삶과 동떨어진 건립·조성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한 경우도 많았다. 엉뚱한 자료로 공약이행을 주장하기도 했고, 실제 이행보다는 계획 수립이나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의 마무리에만 초점을 맞춘 공약도 있었다.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공약을 내세웠지만 구체적인 이행 기간과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노후한 상가의 리모델링 및 업그레이드 지원’ ‘취약계층 여성의 자립 지원 강화’ 공약처럼 세부 기간 없이 대책 마련·지원 등 추상적으로 목표를 제시했다.
경남 함양군의 기초단체장은 2013년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지만 ‘함양스포츠파크 2014년 내 완공’ 등의 불가능한 전시성 사업을 내세웠다. 대전 중구는 ‘보문산 관광벨트화’ 공약 이행을 위해 호동근린공원·문화공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제시했지만 현재 예산 미확보로 공약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기·예산을 감안하면 실현 불가능한 공약들이다.
인천시 서구는 ‘구청의 주인은 주민이므로 구청의 문턱을 없애고 구청의 문을 열 것’이라는 공약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 광진구의 ‘중·고등학교를 인접한 강남 수준으로 상승시킬 것’이라는 공약도 이행률을 평가하기에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었다.
경기 성남시는 이미 철회한 ‘제1공단 공원화’ 공약과 관련해 공원 백지화 이후 계획 중인 법조단지 내용을 제출했다. 부산 해운대구는 ‘국제교육도시연합 가입’ 공약의 이행 근거로 이와 무관한 인문학 시책 추진 자료를 냈다. 실제 공약과는 거리가 먼 엉뚱한 소명자료를 제시한 것이다.
부산시 남구는 복지·생활환경 사업은 제외하고 ‘국제연합(UN) 국제평화 문화특구 조성’ ‘문현 금융단지 조성’ 등 오로지 관광·산업지 조성에만 치중했다. 전북 부안군도 제시한 공약 모두 산업단지·유통센터 건립·조성 사업뿐이었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관계 없는 공약들이다.
부산 강서구는 ‘미래형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강서 농업 발전계획 수립’의 경우 용역만 끝나면 완료되는 공약이기 때문에 빈축을 샀다. 계획 수립까지만 담아 ‘속 빈 강정’ 공약에 불과했다.
대구 수성구의 경우 ‘파동정비사업 확실하게 마무리’ ‘욱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확실하게 마무리’ 등 기존 진행 사업을 자신의 임기 내에만 마무리하면 된다는 식의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충북 충주시가 진행중인 ‘장애인 체육 진흥 사업’ 공약은 예산은 있으나 사업의 방식·내용이 없어 문제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