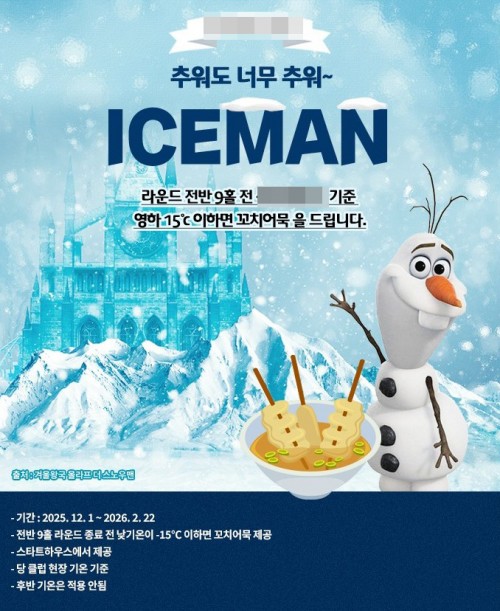호보로스톱스키는 러시아 출신으로 긴 은발의 선 굵고 매력적인 외모와 중후한 음성을 자랑하는 우리 시대 정상의 바리톤 중 한 사람이다. 그는 베르디나 러시아오페라에서 심각하고 무게 있는 성격의 배역을 맡아 특유의 개성을 발산해왔다. 특히 ‘예브게니 오네긴’은 그가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오페라다.
안타깝게도 지난 7일 저녁 ROH의 ‘예브게니 오네긴’ 무대에서 그를 볼 수는 없었다. 호보로스톱스키가 뇌종양을 앓고 있어 치료를 위해 예정된 이날 공연을 취소했고 폴란드 바리톤 아르투르 루신스키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고 미리 안내를 받고 온 길이었다. 실망감은 컸지만 호보로스톱스키가 빨리 병마를 이겨내고 다시금 건강하고 멋진 모습으로 무대에 서길 바랐다.
이번 공연은 새로운 프로덕션은 아니고 2013년 ROH가 토리노 왕립극장, 호주 오페라극장과 공동으로 제작한 것이다. 2013년에는 런던과 토리노에서, 2014년에서 호주에서 공연된 뒤 올해 다시 ROH 무대에 오르는 작품이다. 연출을 맡은 카스퍼 홀텐은 덴마크 왕립오페라단의 예술감독을 지냈고 오페라, 연극 연출가이면서 영화감독이기도 하다. 그는 장편 오페라영화 ‘바람둥이 주앙’을 가지고 지난 2010년 부산국제영화제를 찾기도 했었다.
홀텐은 젊은 연출가답게 새롭고 고정 관념을 깨는 연출을 시도하기로 유명한데 이번 공연 역시 기존 ‘예브게니 오네긴’ 무대와는 조금 다른 스타일을 선보였다. 가장 특이한 부분이라면 주인공인 오네긴과 타치아나의 젊은 날을 투영했다고 추측되는 오네긴과 타치아나가 한 쌍 더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성악가가 아니고 무용수로서 주인공과 같은 의상을 입고 연기하며 춤을 추는데 어느 순간에는 현재의 타치아나와 오네긴에다 젊은 그들까지 네 사람이 한꺼번에 등장하기도 했다.
이는 이제 성숙한 성인이 된 타치아나와 오네긴이 미숙하고 순진했던 젊은 날을 회상하는 상징주의적 연출로 이해되기는 했으나 때때로 혼란스러움과 어색함을 야기하기도 했다. 두 개의 출입구만을 활용한 무대는 별다른 무대전환 없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배경영상을 활용해 여러 장면으로 변환하여 사용됐는데, 단순한 무대에 성악가들의 동선마저 평면적이어서 특별한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
|
타치아나를 노래한 소프라노 니콜 카도 리릭소프라노면서 가볍고 정갈한 소리로 유명한 편지 장면을 제대로 소화했고 오네긴으로 인해 번민하고 갈등하는 모습 또한 잘 그려냈다. 사색적이고 서정적인 이 오페라에서 연출이 인물을 통해 너무 많은 것을 전달하고자 했기 때문에 타치아나와 렌스키가 때로는 과장된 몸짓과 감정을 드러내 보인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날의 렌스키는 테너 마이클 파비아노가 맡았는데 그의 군더더기 없이 매끄러운 가창과 빼어난 연기력은 압권이었다. 파비아노는 호소력 짙은 음색으로 2막 렌스키의 아리아 ‘어디로 가버렸나, 내 젊음의 찬란한 날들은’을 완벽하게 노래해 큰 박수를 받았고 이어진 결투장면은 엄청난 긴장과 박진감을 유발하며 이날 최고의 명장면이 됐다.
세묜 비치코프가 이끄는 ROH 오케스트라의 선율은 어딘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드는 무대의 단점을 모두 덮고도 남을 만큼 탁월했다. 성악가들을 받쳐준 반주부로서의 역할도 훌륭했지만 소리의 두터운 질감이 느껴지는 가운데 섬세한 흐름을 끝까지 놓지 않아 한 편의 애련하고 서정적인 엘레지를 완성했다. 특히 무대의 집중력이 흐트러진 후반부는 오로지 오케스트라가 이끄는 음악의 힘에 의지해 나아갔다고 할 만큼 무르익은 연주력을 보여주었다.
연극과 달리 오페라에 있어 영국은 특유의 전통과 역사가 살아있는 나라는 아니다. 유럽대륙에서 환영받던 정통 오페라가 영국에 들어와서는 유행이 얼마 못 가곤 했다. 영국에 귀화한 헨델이 작곡의 방향을 오페라에서 오라토리오로 돌린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랬던 영국의 ROH가 이제는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오페라하우스로 자리 잡았다.
영국인의 특징을 말해주듯 오페라극장 내부도 상당히 검박하고 실용적이지만 이곳에서 만들어 내는 오페라와 발레 프로덕션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며 상당히 혁신적인 작품경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클래식예술이 나가야할 미래를 제시해 보이곤 한다.
이날 오페라는 러시아어로 이뤄졌기에 당연히 자막이 동반됐다. 그들에게도 쉬운 작품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장을 가득 메운 객석에서는 여유롭게 음악을 즐기고 적극적으로 공연을 만끽하는 분위기가 넘쳤다. 콘텐츠를 생산하는 힘은 사실, 무대가 아니라 객석에서 나온다. 좁다란 도로에 수수하게 서있는 극장을 걸어 나오면서 든 생각이다.
/손수연 오페라 평론가(yonu4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