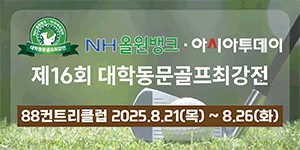부동산PF에 60% 넘게 쏠려..."위험성 측정 기준 마련 및 외부평가 이뤄져야"
|
더욱이 신용공여를 제공한 기업들에 구조조정 대상인 해운·조선업체들이 포함된 경우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이다. 증권사들은 충분히 관리 가능하고 감내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이라고 하지만, 그 위험성에 대해 잣대를 들이밀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과 외부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의 채무보증은 2014년말 19조8906억원에서 지난해말 24조2265억원으로 1년새 21.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유동성공여인 매입보장약정은 7조7823억원에서 7조4173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지만, 지급보증과 매입확약 등 신용공여형 채무는 12조1083억원에서 16조8092억원으로 4조원 넘게 급증했다.
증권사별로 살펴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메리츠종금증권(296%)·교보증권(190%)·하이투자증권(169%)·HMC투자증권(142%)·IBK투자증권(118%) 등의 채무보증 규모가 자기자본 대비 100%를 넘어섰다. 신용공여 비중은 메리츠종금증권(99.0%)·HMC투자증권(84.7%)·하이투자증권(81.3%)·신한금융투자(80.5%)·미래에셋대우(79.6%) 순으로 나타났다.
매입보장약정은 차환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이 시장에서 전량 매각되는데 실패할 경우 최초 약정에서 정한 조건대로 사들이는 것으로, 시장의 자금경색 등에 노출돼 있으나 기초자산의 신용위험과는 관련이 없다.
그러나 매입확약은 신용위험 발생시 기초자산을 정해진 가격에 매입하며 유동화증권의 상환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시장위험 뿐 아니라 기초자산의 신용위험 또한 증권사가 최종적으로 상환책임을 지는 형태다.
안나영 한국기업평가 책임연구원은 “2012년 이후 신용공여형 우발채무 비중이 급증하면서 양적 증가뿐 아니라 질적 측면의 신용위험 증가세가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우발채무의 대부분이 부동산PF에 쏠려 있는 점도 문제다. 부동산 업황 위축, 자금시장 경색, 신용등급 하향 등의 상황에서 일시에 대규모 유동성 부담이 발생할 경우 대응력에 한계를 드러낼 수 있어서다. 최근 진웅섭 금감원장도 전체 채무보증의 약 62%인 15조원이 부동산PF에 관련돼 있어 채무보증이행률이 급증하는 경우 증권사의 유동성과 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부동산PF에 대한 채무보증은 일반적으로 2~3년의 장기계약이 많아 위험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당장 채무보증 규모를 줄인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동산PF 관련 우발채무는 부동산 경기에 따른 신용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건설경기를 볼 때 부동산PF 관련 우발채무가 언제 직접적인 채무로 전환될지 알 수 없다”며 “신용공여를 제공한 대상들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해당 기업들에 조선사·해운사가 다수 포함됐다면 증권사의 채무로 직결되기에 최소한 위험도에 대한 테스트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유동성 우려가 불거지자 증권사들은 점진적으로 채무보증 규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HMC투자증권은 올해 안에 자기자본 대비 부담률을 100% 이하로 낮추고, 교보증권은 연간 30%씩 감축해서 2018년말까지 100%를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규제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황 실장은 “증권사들이 채무보증 기업의 부실로 위기상황에 직면하는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고, 특히 금융당국의 스트레스 테스트 등 외부적인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