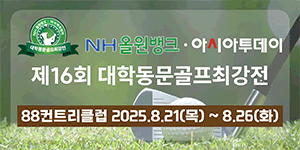|
헌재는 30일 재판관 6(일부위헌)대 3(합헌)의 의견으로 민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166조 1항과 766조 2항 중 과거사정리법 2조 1항 3호 내지 4호에 규정된 사건(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일부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과거사정리법상의 해당 사건들에 불법행위의 주관적 기산점(안날로부터)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객관적 기산점(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해 청구인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미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은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누명을 씌워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소속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며 “사후에도 조작·은폐함으로써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소멸시효 법리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 같은 특성으로 인해 과거사정리법에 규정된 위 사건 유형에 대해 일반적인 소멸시효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재는 “국가가 소속 공무원들의 조직적 관여를 통해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집단 희생시키거나 장기간의 불법구금·고문 드엥 의한 허위자백으로 유죄판결을 하고 사후에도 조작·은폐를 통해 진상규명을 저해했음에도 그 불법행위의 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는 것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지도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