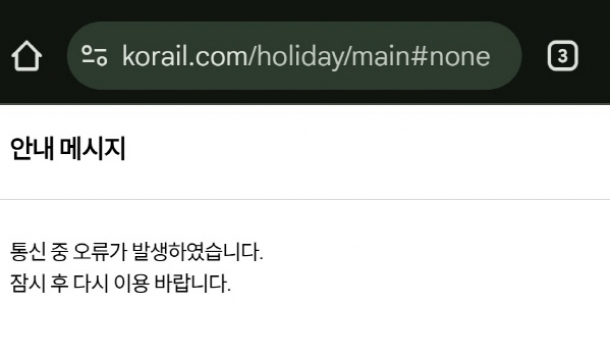|
소설뿐만이 아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네덜란드 연구진은 ‘넥스트 렘브란트’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렘브란트 작품을 학습한 인공지능이 렘브란트풍의 그림을 그려내도록 했다. 구글이 개발한 인공지능 딥드림(Deepdream)은 일상 사진을 고흐나 뭉크 등의 그림처럼 바꾼다. 쥬크덱이라는 영국의 스타트업이 인터넷에 공개한 인공지능 음악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누구나 각자의 스타일로 음악을 만들 수 있다.
아직까지는 사람이 몇 가지 설정을 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해 창작하는 수준이지만 앞으로 점점 사람의 개입을 줄여 인공지능이 스스로 창작하는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할 것이다. 창작은 쉬워지지만 그에 따라 미묘한 법적 문제도 생긴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창작물은 누구의 창작물인가? 순수한 사람의 창작물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가? 인공지능이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으로 만들어낸 창작물이 남의 작품과 흡사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책임을 져야 하는가?
우리나라 저작권법 2조 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이에 한정해 저작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사진작가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것처럼 사람이 인공지능을 단순한 도구로 이용해 창작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진화로 사람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이 자체적으로 창작하는 단계까지 가면 더 이상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게 된다. 인공지능 창작물을 기존 법상의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혀 보호하지 않으면 인공지능 개발의욕을 꺾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무한정 쏟아지는 인공지능 창작물을 사람의 창작물과 같은 수준으로 보호하면 정작 사람의 창작 여지가 줄어들게 된다. 결국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적정한 수준의 보호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에 의한 저작권 침해 문제도 전통적인 접근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종래의 재판실무에 의하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남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남의 저작물에 ‘의거(依據)’하여(의도적으로 ‘베꼈다’는 것보다 좀 더 넓은 의미이다) 작성됐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학습해 창작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남의 저작물과 흡사한 경우에도 ‘의거’ 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 저작권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 것이다. 역시 새로운 접근방식에 의해 기존 저작권자와 인공지능 산업계 간에 이해관계를 적정한 선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IoT 등 기술의 발달은 기존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만든다. 기존의 법제도로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부족이다. 기술의 개발을 억누르지 않으면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보호하고 조정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변화에 알맞은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 법률가만의 문제는 아니니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란다. <성창익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