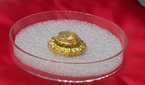팔레스타인 난민, 레바논 정부의 불법 외국인 노동자 단속에 시위나서
|
레바논의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새롭게 시행된 레바논 노동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레바논 노동부는 지난달 기업들에게 노동 허가증이 없는 직원들을 한 달 내로 정리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들은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목이지만 사실상 시리아 난민들을 겨냥한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시위에 나선 것은 이번 조치로 ‘유탄’을 맞지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인 셈이다.
알자지라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레바논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난민 수백명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무허가 외국인 노동자 단속에 나선 레바논 정부에 맞서 수도 베이루트와 난민촌 인근에서 시위를 벌였다. 레바논 노동부는 지난달 기업들에게 한 달 내로 노동 허가증이 없는 직원을 정리하지 못할 경우 폐쇄시킬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실제 지난 10일부터 당국의 단속이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적발된 위반 사례만 550건, 구금된 기업주는 150명 이상이다.
이번 법안은 본질적으로 내전을 피해 레바논으로 대거 유입된 시리아 난민들을 겨냥하고 있다. 레바논 노동부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해 자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겠다는 입장. 지난달 레바논 노동부는 성명을 내고 “레바논은 불법 외국인 노동자, 특히 불법 시리아 난민들 때문에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레바논에 적을 두고 있는 난민의 수는 레바논 인구(약 600만 명)의 3분의 1 수준인 200만명. 이 가운데 2011년 시리아 내전이 시작되면서 레바논으로 옮겨 온 시리아 난민이 150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시리아 난민들을 겨냥한 이번 법안이 자신들에게까지 타격을 입힐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시위에 나선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레바논 정부가 기업 폐쇄 및 노동자 단속을 중단하고, 노동법에 팔레스타인 난민의 권리를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레바논 당국은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경우 노동 허가증을 받아 합법적으로 노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법안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고 말한다. 카밀 아부 슐레이만 레바논 노동부 장관은 “불법 외국인 노동력에 대처하기 위한 노동부의 계획은 팔레스타인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적발된 550건의 위반 사례 중 팔레스타인 소유의 기업은 단 2곳에 불과하다.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대응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시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기준으로 레바논 내 팔레스타인 난민 수는 17만4000명에 달했지만 노동 허가를 받은 난민은 4만명에 못 미쳤다.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1948년 아랍-이스라엘 전쟁(The Arab-Israeli War)으로 대거 레바논 남부로 유입돼 현재 난민촌 12곳에 거주하고 있다. 1995년 레바논 당국은 ‘레바논 태생의 팔레스타인 난민 중 노동 허가증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노동을 허용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지만 이들에게 노동 허가증 취득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2005년 친(親)헤즈볼라 성향의 트라드 하마데 당시 레바논 노동부 장관이 팔레스타인 난민들에 대한 직업활동 제한을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하며 노동권이 일부 진전을 보이는 듯 했지만 여전히 의학·법률·건축 등 72개의 전문 분야에서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직업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레바논의 노동법이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불공평한 상황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한다. 카말 함단 레바논 경제학자는 "팔레스타인인들이 레바논으로 건너온지 70년이 넘었다. 이제는 팔레스타인인들의 노동권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많이 본 뉴스
연예가 핫 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 “이스라엘, 이란 보복 공격… 이스파한 지역 폭발음”
- 정부, 국립대 ‘의대 증원 조정’ 건의 수용할 듯…3시 발표
- 尹, 4·19묘지 참배…“자유민주주의 더욱 발전시킬 것”
- 최상목, 野 추경 요구에 “지금은 민생·약자 지원에 집중”
- 이화영 ‘검찰 술파티’ 했다는 날…檢 일지엔 ‘구치소 복귀’
- 어플로 단숨에 신분증 위조…자영업자 울리는 청소년들
- ‘뚝뚝’ 떨어지는 원화 실질 가치…OECD 중 5번째 저평가
- 이재용, 포브스 ‘韓 50대 부자’서 처음 1위 오른 이유는
- ‘경찰국 반대’ 주도한 류삼영…법원 “정직 3개월 타당”
- 아워홈 ‘남매의난’ 재점화…구지은 부회장, 이사회서 퇴출













![[飛上 대한항공] ‘3년 여정’ 끝…아시아나 화물매각 전..](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04m/18d/20240418010010459_77_50.jpg?c=202404191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