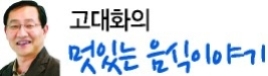 |
더운 복날. 펄펄 끓는 뜨거운 음식이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습니다. 먼저 부들부들한 닭고기를 먹어봅니다. 어린 닭이라 그런지 달달하고 여린 식감입니다. 닭고기는 성질이 따뜻하여 소화도 잘되고 비위가 약한 분들에게 좋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닭 국물과 찹쌀밥을 함께 먹으면, 입 한가득 고소한 맛이 퍼집니다. 그리 열심히 씹지 않아도 녹아내리는 듯한 감미이지요. 찹쌀밥을 넣어 푹 삶은 거라서, 약간의 찰기가 더해져 더 식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닭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갑니다. 캬아. 거 참 시원합니다. 뜨거운 국물을 먹고 땀 흘리면서 시원하다고 하는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이지요. 열은 열로 다스린다는 이열치열(以熱治熱). 거기에, 그 몸에 좋다는 인삼까지 더 해졌으니 손상된 원기를 회복하고 떨어진 면역력을 보충하는 데 이보다 좋은 음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소금쳐서 먹고, 깍두기, 김치를 양껏 곁들이면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량의 2배가 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삼계탕을 먹을 때는 소금이나 국물은 가급적 적게, 포화지방이 많은 닭 껍질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여름철 보양식중에 삼계탕집이 제일 북적이는건 싸고 누구나 즐기는 음식이기 때문이지요. 한국인이 먹는 육류 중에 닭고기가 제일 쌉니다. 사료 주는 양에 대비해서 체중이 증가하는 속도가 소·돼지와 비교해 월등히 효율이 높아서 그렇답니다. 고기로 먹는 닭을 육계라 하는데, 이 육계를 식당에서 먹는 닭의 크기까지 키우는 데 30여 일이면 된다고 합니다. 30일이라. 솔직히, 채소보다 더 빨리 자란다고 할 수 있는 속도이지요. 닭의 평균 수명이 5년정도 된다는데, 태어난지 30여일 지난 닭을 영계백숙이라해서 요리해먹는 거지요. 고기가 질기지 않아 인기라고 합니다. 왠지 조금 미안해지기도 합니다.
사위가 처갓집에 가면 씨암탉을 대접한다는 이야기 들으셨지요? 지금은 흔해빠진 것이 닭고기입니다만, 1960년대 만해도 닭이 흔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위나 와야 씨암탉 잡아주던 거지요. 한국인이 닭고기를 보양 음식으로 여기는 것은 그 가난한 시절의 추억이 아직도 강렬하게 뇌리에 남아 작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어렸을 때, 시골 외갓집에 가면 마당에 닭들이 뛰어다니곤 했습니다. 아침에 눈뜨면 닭장에 가서 갓낳은 달걀을 가져오는 것도 막내인 제 몫이었지요. 매일 신선한 달걀을 서너개씩 낳아주던 그 닭들은, 붉은 벼슬이 당당한 위엄 있고 성질 있어 보이는 장탉과, 퉁퉁한 씨암탉, 그리고 살집좋은 암탉들이었습니다. 마당에서 자유롭게 커서, 걸음걸이도 게으르게 느리고, 아침이면 꼬끼오하고 울어서 잠을 깨워주고는 했습니다.
어느날, 제 아버지, 즉 맏사위가 오시면 외할머니가 닭을 잡아주셨지요. 정말로 닭을 “잡아” 주신겁니다. 마당에 뛰어놀던 통통한 닭 두어 마리를 잡아오라 하신 말씀에, 한참동안 난리가 납니다. 이 장닭이 거의 하늘을 난다 싶을만큼 높이 뛰어오르고, 나뭇가지에 앉기도 했답니다. 북새통끝에 겨우겨우 닭들을 체포하면, 외할머니는 마당 한 켠 가마솥에 장작불을 지펴 정성들여 닭털을 뽑고, 인삼듬뿍 넣어 삶으셨지요.
사실 꽤 오래 걸린답니다. 푹 고아야하니까요. 마당에 퍼지던 달달한 닭국물의 냄새. 장작불의 쎈불의 기운이 녹아있는 찹쌀밥과 국물맛. 그 때의 닭맛은 오늘 먹은 영계보다 좀 질겼던 것 같습니다. 토종닭은 약간 질기다 싶을 만큼 살이 차지고 감칠맛이 더 있거든요. 요사이 나오는 닭들은 대부분 외래종이라 이 맛을 충족시켜주지는 못하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나라 토종닭은 예로부터 명성이 있습니다. 조선 중종때 조선 닭의 명성이 명나라에 널리 퍼진 탓에 중국 사신들은 조선에 오면 한결같이 수탉의 붉은 벼슬을 요리한 계관육(鷄冠肉)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수탉의 양기와 붉은 벼슬의 힘이 더해져 정력을 강화하는 최고의 음식으로 여겼기 때문이라 합니다. 이런 계관육을 대접받은 사신은 어떤 트집도 잡지 않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는 웃지 못할 기록도 전해집니다.
그래도 솔직히 저는 어쩐지, 옛날 외할머님이 끓여주시던 토종닭 백숙이 요즈음의 영계백숙보다 훨씬 좋습니다. 물론, 고기가 조금 질기기는 합니다만, 씹는 맛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먹은 녀석은 태어나서 30여일, 어두컴컴한 양계장에서 운동도 하지 않고 사료만 먹이고 살찌운 녀석이거든요. 정말 보양이 될까하는 생각도 들고요.
옛날, 외할머니 마당 좁다하고 쏘다니며 어깨피고 뛰어다니던 장탉이나, 살 퉁퉁하고 기름기 흐르던 씨암탉정도 되어야 보양이 될 것 같아서요. 아니, 어쩌면요. 맏사위 얼굴 헬쓱해보인다고 씨암탉 장닭 아낌없이 잡아서 행여 탈새라 몇시간동안 가마솥을 지키며 삼계탕을 끓여내시던, 외할머니의 사랑이 그리운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많이 본 뉴스
연예가 핫 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 정부 “의료개혁특위에 전공의·의사 자리 비워두고 있다”
- “尹, 채상병 특검법 사법절차 어기는 나쁜 선례로 인식”
- ‘이재명 최측근’ 박찬대, 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
- 홍준표, 이재명 겨냥 “재판 받는 사람이 尹 범인 취급”
- 이창용 “상황 많이 달라졌다”…금리 인하 사실상 ‘원점’
- 檢, 윤관석 의원 ‘뇌물 혐의’ 관련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 “봄이 왔네요” 유럽 출장 후 웃으며 돌아온 이재용 회장
- 尹 “효도하는 정부…기초연금 임기 내 40만원까지 인상”
- 법무부, 이화영 ‘술판 회유’ 주장에 “금지물품 제공 없어”
- 황우여 與 비대위원장 “재창당 수준 넘어선 혁신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