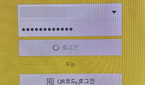경제·장래 문제로 10명중 7명 입양선택
미혼모 품 떠나는 유아 연간 3000명
미혼모 품 떠나는 유아 연간 3000명

'아버지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모르는 핏줄' 미혼모들은 사회적 냉대와 무관심으로 10명중 7명이 육아를 포기한다. 통계에 따르면 연간 3000명의 미혼모의 아이들이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지고 있다. 사진은 탁아봉사자가 미혼모 아이를 앉고 있는 모습.
“아이를 지우려고 했지만 뛰는 심장, 뱃속의 움직임을 느끼고는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인 제가 아니면 누가 이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겠어요.”
미혼모 시설 퇴소를 일주일여 앞두고 있는 올해 26살의 미혼모 최영은(가명)씨. 그녀는 아이를 낳겠다고 마음먹게 된 계기를 얘기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지난 20일 서대문구 대신동 이화여대후문 인근에 위치한 미혼모 시설 ‘애란원’에서 어렵사리 영은씨를 만날 수 있었다. 혹여,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미혼모들은 외부에 노출을 극도로 꺼린다는 것이 복지시설측의 설명이다. 더구나 언론과의 인터뷰는 쉽지 않은 결정이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난해 11월 시설에 입소한 영은씨는 올해 1월 중순 아이를 낳았다. 동갑내기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였지만 아이 아빠는 이들을 외면했다. 이후 출산을 결심했다는 사실까지 알렸지만 연락이 두절된 지 이미 오래다.
영은씨의 부모는 아예 자신들의 손자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부모의 질책이 두려웠던 영은씨는 임신을 얘기하지 못했고 배가 불러오자 집을 나왔다.
“임신 5개월까지 고민하다가 집에는 어학연수를 가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무작정 집을 나섰어요. 고교 졸업 후 경리로 일해오던 회사도 그만 둘 수밖에 없었고요.” 이후 영은씨는 이후 3개월간 친구집을 전전했다. 그녀에게는 무척 힘든 시기였다.
영은씨는 혼자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수소문 끝에 미혼모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아이 양육까지 생각해 애란원의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모두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미혼모시설은 전국적으로 25곳에 수용인원은 640여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는 2007년 말 현재 정원의 3배가 넘는 2100여명에 달한다.
미혼모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도 여성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업무가 이관되며 일부 끊어졌다,
애란원 한상순 원장은 “요보호 아동이나,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많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있다. 금융기관에 자금 운용을 맡기는 아동복지시설도 다수인데 반해 미혼모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매우 미미해 대부분 복지시설에서 힘겹게 운영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재활 프로그램 운영비도 대부분 각각의 복지시설에서 충당하는 선에 그쳐 시설 운영비는 항상 빠듯하기만 하다.
한 원장은 “대부분 젊은 여성인 미혼모의 재활에 사회가 조금만 더 투자하면 고아나 유아 방치, 학대 등의 문제를 줄여갈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하다.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았느냐’는 것이 미혼모들을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현주소다. 그리고 이러한 시선은 미혼모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영은씨 역시 가장 견디기 힘든 부분으로 ‘주변의 차가운 시선’을 꼽았다.
“주민센터를 찾았는데 직원이 혼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렇다’고 했더니 위 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에 순간이었지만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한 생명을 지켰습니다. 그런 제가 그렇게 큰 죄를 지은건가요?”
영은씨가 지난 1년여전부터 겪고 있는 심적, 물적 고통을 30여분간의 짧은 인터뷰를 통해 모두 담아낼 수는 없었다.
취재진은 어렵게 인터뷰에 응해준 영은씨를 위해 기저귀를 작은 선물로 전했다. 순간이지만 얼굴이 밝아졌다.
기뻐하고 고마워하는 영은씨의 모습은 미혼모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얼마나 절실함을 말해주고 있었다.
많이 본 뉴스
연예가 핫 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 삼성전자, 반도체 수장 전격 교체…전영현 부회장 임명
- 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수순
- 육군 32사단서 수류탄 훈련 중 사고…훈련병 1명 숨져
- 與 원내대변인 ‘1980년대생 초선’ 조지연·박준태 지명
- 서울대판 ‘N번방’ 성범죄 터졌다…40대 서울대생 구속
- “황올 2만3000원 됐다” BBQ치킨 가격 평균 6.3% 인상
- 식당서 “소주 한 잔만 주세요”…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
- 8억짜리 아파트 4억에…세종 반값 ‘줍줍’ 얼마나 몰릴까
- “뻔뻔한 김호중 구속하라”…거짓말 잔치에 등 돌린 팬심
- 추경호 “여야 합의 없는 특검, 역대 어느 정부서도 거부”










![[속보] 육군 32사단 훈련 중 수류탄 터져…1명 심정지](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05m/21d/20240521010010350_77_50.jpg?c=202405211200?1)

![[데스크 칼럼] 구조조정 목전의 SK, 비온 뒤 땅 굳는..](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05m/20d/20240520010009844_77_50.jpg?c=202405211200?1)
![[2보] 육군 32사단, 수류탄 훈련 중 사고…훈련병 1..](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05m/21d/20240521010010384_77_50.jpg?c=202405211200?1)
![[포토]한동훈 전 장관처럼 머그컵 손에 들고 회의 참석하..](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05m/21d/20240521010010314_77_50.jpg?c=202405211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