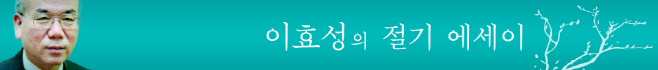|
이처럼 우수는 봄바람이 불고, 매서운 겨울 추위가 가시면서 바람 끝도 에이지 않고, 쌓였던 눈과 얼음이 녹기 시작하고, 눈보다는 진눈깨비나 비가 내리고, 얼었던 땅이 풀리고, 시냇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절기다. 슬슬 녹아 없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우수 뒤에 얼음같이’라는 속담은 그래서 생겼으리라. 이 무렵의 나무 가지 우듬지는 홍조를 띠며 싹이 트기 시작하고 들판에서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기도 한다. 대기는 아직 싸늘하지만 이처럼 우수 무렵의 경물은 겨울에는 보기 어려웠던 비, 시냇물, 새싹, 아지랑이 등의 봄이라는 새 계절을 여는 물상들이 많이 나타난다.
우수가 되면 기러기 떼가 시옷자 대형을 지어 북쪽으로 날아가고, 동물들도 더러 동면에서 깨어나기 시작하고, 남녘에서는 동백꽃, 매화, 납매화, 유채꽃, 보춘화, 수선화, 눈꽃풀(snowdrop), 크로커스(crocus)가 피기도 하는 등 봄과 그에 따른 소생의 기운이 온 산천에 가득해져 간다. 그래서 우수 어간에 남녘에서라면 시절의 변화에 민감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둔감한 사람조차도 봄이 오고 있음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무렵에는 중부지방에서도 매실나무, 산수유, 목련, 벚나무 등의 가지에는 꽃눈이, 은행나무 가지에는 잎눈이, 분화하여 이미 상당한 크기로 망울져 있고, 산야에는 냉이와 민들레를 비롯해 꽃다지, 광대나물, 쑥 등의 이른 풀들이 가녀리게 자라 있다.
|
그런데 씨앗이나 뿌리로 겨울을 나는 식물들이 이 미세한 자연의 변화를 알아채고 그에 반응한다는 것은 참 신기하고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는 흔히 자연의 신비로 또는 생명의 위대함으로 말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 신비한 힘 또는 생명의 위대함은 마술이나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실은 오랜 세월 동안 생명체가 일조량과 기온의 미세한 변화를 알아채고 봄에는 소생으로 그리고 늦가을에는 동면으로 환경에 적응하고 추위를 극복한 적자생존이라는 생물 진화의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동식물은 그냥 알아채는 것을 우리 인간은 과학을 동원하여 겨우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매화는 제주도에서는 입춘 전후부터 그리고 남해안에서는 우수 전후부터 피기 시작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눈 속에서도 피어나기도 한다.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휴애리의 봄맞이 매화축제는 우수 무렵에 열린다. 과수(果樹)를 비롯한 나무의 가지치기는 대체로 나무의 생장 휴지기인 늦가을부터 이른 봄까지 하는데, 특히 날씨가 풀리는 우수 절기에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간장은 흔히 3월(음력)장이라고 해서 청명 무렵에 담그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더러는 정월장으로 우수 무렵에 담그기도 한다. 홍어의 제철은 겨울부터 이른 봄까지의 산란기이지만 겨울에는 너무 추워 홍어 잡이 배들이 주로 날씨가 풀리는 우수 절기에 출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