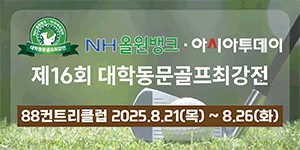김해지점 대출직원 관행 이용해 범행
1년간 35번 횡령에도 은행 인지 못해
횡령직원 "개인 압박감에 자수" 진술
|
이에 검찰도 은행의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질타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앞서 10년간 진행됐던 '700억 횡령'도 감지하지 못했던 터라, '내부통제'를 전혀 개선하지 못한 채 재발방지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아시아투데이가 입수한 16쪽 분량의 '우리은행 김해금융센터 횡령 사건' 관련 공소장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 6월 10일 김해서부경찰서에 자수하기 직전까지 횡령을 이어왔다. 구체적으로 2023년엔 △7월 1번 △8월 1번 △9월 2번 △10월 3번 △11월 2번, 2024년은 △2월 7번 △3월 6번 △4월 2번 △5월 11번 등으로 횟수도 점차 늘었다.
특히 은행 내 관행을 적극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은행에서 기업금융 대출업무를 담당하던 대리급 직원 A씨는 2021년 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를 진행하다가 약 2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되자 '은행 돈'에 눈독을 들였다. 고객들이 도장 날인 등을 요구한 자신에게 아무런 의심을 갖지 않는다는 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은행의 '낡은 관행'이 범행에 주효했다.
구체적으로 대출 과정에서 결재권자인 상급자가 자리를 비울 때 담당직원이 직접 대출을 결재할 수 있는 관행이 있었다. 또 대출요청 이후 통상 본점이 대출명의자의 계좌로 바로 입금해야 하지만 신청 방식에 따라 본점에서 영업지점으로 돈을 보낸 뒤 이를 다시 영업지점 담당자가 대출명의자에게 전달하는 일도 있었다.
A씨는 이 과정을 악용했다. 고객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신청하고, 본점에서 영업지점으로 들어온 대출금을 지인의 계좌로 보낸 뒤 다시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이다.
범행과정을 두고 본점과 영업지점이 한 차례 확인만 했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수사를 담당한 창원지검 측도 "은행 차원의 적절한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사실이 각각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횡령 사건과 관련해 피해 기업의 잘못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아울러 은행 측 해명과 전혀 다른 정황의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시아투데이 취재 결과 A씨는 지난 6월 10일 김해서부경찰서에 자수할 당시 "범죄금액이 너무 커져 개인적인 압박감이 들어 자수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는 사건이 불거질 당시 우리은행 측이 밝혔던 설명과 다르다. A씨 자수 당시 우리은행은 "은행 여신감리부 모니터링을 통해 대출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A씨에게 소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자수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은행 조사와 관계없이 자수했다는 A씨 진술과 더불어, 금융감독원 역시 A씨가 자수하기 전까지 은행이 횡령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은행은 '내부통제 소홀'이란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범행이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이뤄진 것은 물론, 본점도 이상 징후를 충분히 알아챌 만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횡령을 저지르고, 자체 제작한 각종 허위서류를 우리은행 본점 담당자에게 전송해 허위대출을 받았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앞서 발생한 700억 횡령 사건 때도 최초 범행 시점인 2012년 이후 10년 가까이 횡령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22년이 돼서야 뒤늦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직원 B씨는 범행 당시 허위문서를 작성해 본점에 보고한 바 있는데, A씨 사례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우리은행이 '재발방지'에 실패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경찰 등은 A씨를 도운 공범이 있는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