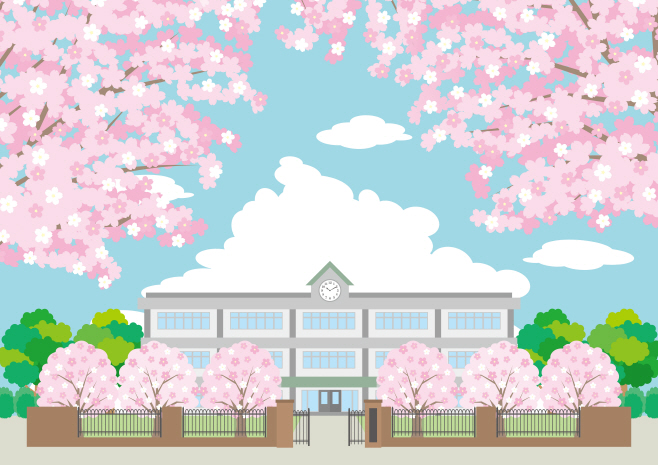‘공문 한 장’으로 버티는 유해업소…학생 안전은 뒷전
|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학교 주변에서 적발된 불법 유해업소는 790곳으로 전년(764곳)보다 26곳 늘었다. 업종별로는 기타(노래연습장·단란주점·유흥주점·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등) 296곳, 마사지 업소 262곳, 무허가·무등록 154곳, 게임장 78곳이었다.
특히 적발된 업소는 대부분 퇴폐 마사지, 변종 유흥주점, 전신 안마 등을 내세운 '위장업소'로, 일반 점포처럼 꾸며져 있지만 내실은 성매매 알선 등 불법 영업이 대다수다.
서울의 경우 최근 2년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만 227곳의 유해업소가 적발됐다. 문제는 적발 이후에도 업소가 사라지지 않는다는데 있다. 일부는 간판만 바꾸기도 하고, 일부는 명의만 바꿔 '재영업'에 나서는 등의 수법을 반복하고 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과 상대보호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나뉜다. 보호구역 내 학교 보건위생과 학습에 영향을 끼치는 금지행위 및 시설(모텔, 노래연습장, PC방 등)의 설치·행위를 제한한 것이 교육환경 보호제도다.
더 큰 문제는 적발 업소에 대한 철거 조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교육환경법 제10조 제1항은 지자체장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업소에 대한 영업정지나 시설철거 등을 명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 재량에 맞겨져 있어 실제 이행률은 낮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학생보호구역 내 유해업소 단속 전담 부서를 따로 운영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점도 문제다. 대부분 구청에서는 아동청소년과, 도시안전과, 위생과 등 기존 부서에서 해당 업무를 병행하고 있지만 전담 조직이나 인력은 마련돼 있지 않다.
경찰 단속 후 지자체에 철거나 영업정지를 요청해도 시간이 걸리거나 '행정 소송 우려'로 처리가 미뤄지는 경우가 많다. 일부 업소는 건축물대장에 '화장품 가게'로 기재돼 있어 행정처분이 더뎌지는 경우도 있다. 불법 영업이 명백하더라도 자치구에서는 실내 CCTV, 직원 진술, 카드 결제 내역 등 '사법적 수준의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처분이 어렵다.
경찰은 보호구역 내 유해업소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단속해도 지자체가 처분을 하지 않으면 업소는 다시 문을 연다"며 "지자체 내부에서도 관련 민원이 돌아다닐 뿐, 철거까지 연결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분절된 단속 체계를 넘어 통합적인 유해환경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해업소들이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우후죽순 생겨나는 구조"라며 "단속 하면 또 다른 형태로 변종이 나오고, 그렇게 비행의 양상이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응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단속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신종 업소 유형에 대한 법적 정의를 정비하고 신고제의 실질적 검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