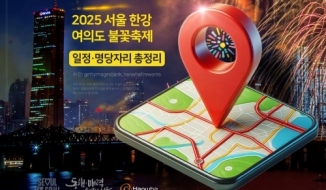|
우선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조직이 분리되면 새로운 보직이 늘어나는 만큼 기재부의 인사 숨통이 좀 트이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기재부 A 직원은 "사무관에서 서기관을 거쳐 부이사관까지 오르는데 2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은근히 조직 분할을 기대하는 직원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행정고시 재경직 출신 직원 비중이 높은 기재부는 전 부처 중 인사 적체가 가장 심한 조직으로 꼽힙니다. 다른 부처에선 동기가 국장이지만 기재부에선 과장에 머물고 있는 경우도 다반사죠. 최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에도 예산실장과 세제실장 인사를 단행한 것은 적체된 인사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기재부 분리가 현실화해도 기대한 만큼 인사 적체 해소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것이죠. 기재부 B 직원은 "조직이 분리되면 자연스럽게 보직이 늘어난다는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재 인사 적체가 단번에 해소될 만큼은 아닐 것"이라며 "한번 늘어난 보직을 다시 줄이기는 쉽지 않은 만큼 정부 조직·정원 등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의 반대가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가 분리될 경우 지금처럼 신속하고 원활한 정책 추진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현재 기재부 체제는 이명박 정부 시절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재정 부분 통합으로 구축됐습니다. 기재부가 예산 편성과 재정·평가·세입세출을 모두 맡으면서 정책 추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됐죠. 하지만 예산 편성권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잃어버리면 향후 정책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B 직원은 "기재부의 예산 편성 권한이 각 부처와의 정책 조율에서 주도권을 갖게 해준다"며 "이를 바탕으로 원활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조직 분리로 예산 기능이 사라진다면 정책 추진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만약 조직 분리를 주장하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실제 조직 개편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강력한 정책 추진을 위해 현재 기재부가 가진 권한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기재부 C 직원은 "과거에도 몇 차례 기재부 개편 논의가 있었지만 현실화하지는 못했다"며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경제사령탑 자리에 입맛에 맞는 인물을 앉히면 현재 기재부가 가진 강력한 권한은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재부 분리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기재부를 두고 다른 부처 위에 군림하는 '옥상옥'이라는 비판도 존재했던 만큼 조직 개편의 필요성도 좌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우리나라는 급격히 변화하는 통상 환경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만연한 대외 여건을 고려하면 아직은 강력한 경제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