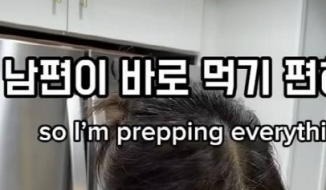|
나 작가의 작품은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생각해 온 동양적 세계관을 따라 몸이 외부 세계와 교류하고 몸이 기억한 이미지를 형상화 한다. 그의 작업은 의식을 몸과 마음에 집중해 이러한 과거의 강렬한 기억을 소환하고,그때의 감정과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감정이 먼저인지 이미지가 먼저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몸에 각인된 무의식적인 이미지들을 생성해 낸다.
어떤 경우는 최면을 통한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발견한 내적 불안의 요인이 되는 무의식적 이미지들을 소환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미지들이 복합적으로 뒤섞인 작품은 결과적으로 현실에 있음 직한 어떤 장면을 연상시키지만 공간이나 서사가 선형적이지 않고 꿈속의 이미지처럼 비현실적이고 모호하다. 그러나 그것이 살바도르 달리나 막스 에른스트의 초현실주의 회화에서처럼 전적으로 무의식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이미지들은 자신이 과거 현실에서 외부 세계를 직접 경험한 리얼리티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오히려 몸과 세계가 상호 침투하며 정보를 교환하는 역동적인 '연기(緣起)' 작용을 포착하려 했다는 점에서 '과정적 리얼리티'라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역동적인 몸의 질서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분법적인 대뇌의 지적인 분별 작용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또한 표현주의 예술에서처럼 주체의 주관적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객이 미분화된 몸의 생명 작용을 응시하는 관찰자가 되어야 한다. 이를위해서는 외부로 흩어진 산만한 정신을 거둬들여 오직 몸에 의식을 집중하여 현존해야 한다. 그래서 몸이 이완되고 뇌파가 세타파(4~8Hz)로 고요해지면 의식과 무의식, 현실과 꿈, 몸과 우주의 경계가 사라지고 어떤 몽환적인 이미지가 어렴풋이 떠오른다.
나 작가의 회화는 뜬구름같이 모호한 이러한 이미지에 질서를 부여하며 생겨난 것이다. 이처럼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던 몸의 이미지를 소환해 내는 작업은 깊은 몰입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명상 수행과 다르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그의 작업은 자신이 오랫동안 실천해 온 명상과 요가 수행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불안한 감정을 정화하는 치유의 행위이기도 하다.
나 작가의 초기 작업은 화려하지 않고 하찮게 여기는 강아지풀과 교감하며 문인화의 정신성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마음이 끌린 하나의 외부 대상에 의식을 집중함으로써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최근작들은 그림의 대상을 외부 대상에서 자신의 몸으로 치환함으로써 몸의 기억이 생성해 내는 다층적 이미지를 다루고 있다. 그럼으로써 명상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타성에 젖은 종래의 양식에 파격적 변화를 불러왔다.
이러한 과감한 변화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화두가 된 몸의 미학적 가능성을 탐구하면서 종래의 단조로운 표현에서 벗어나 자기 몸의 현존이 생성해 내는 풍요로운 시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변신이라고 할 수 있다.
'현존의 기억' 전시는 에이치플럭스 전시 후 다음 달 1일부터 16일까지 국회아트갤러리에서 이어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