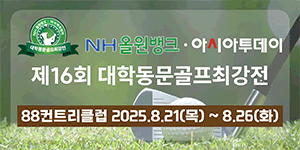|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새 정부의 보험산업 정책: 공공신탁을 통한 보험금청구 간병비 전환'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공신탁제도는 치매 및 장애 등으로 인해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의 자산을 공공기관이 수탁·관리하는 제도다. 송 연구위원은 공공신탁제도가 도입될 경우 신탁에 대한 기존 제도적·심리적 장벽을 해소해 신탁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공공신탁제도는 고령자의 자산이 인지기능 저하나 장기요양 상태 진입 등 특정 조건 발생 시 간병비나 의료비 등으로 자동 집행되도록 설계돼 공적 돌봄 재정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령층 자산은 상속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는 부동산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의 자산 중 81.2%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며, 전·월세보증금을 제외한 저축성 금융자산은 가구당 평균 9258만 원에 불과했다. 본인의 간병비나 생활비 용도로 공공신탁을 설정할 수 있는 자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다.
이에 송 연구위원은 조건부·불확정 보험금청구권의 신탁재산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고령층은 상해 및 질병 위험에 대비해 민영보험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이 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을 공공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신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신탁재산으로 인정되는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금이 3000만원 이상인 일반사망보험으로 한정돼 있다. 암·중대질병·치매·장기요양 등 진단금 또는 생활자금 명목의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 여부 및 시점이 불확정한 조건부 채권으로 간주돼 신탁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사망 외 보험금청구권의 신탁 편입은 지급 여부 및 시점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실무적 관리 부담과, 보험금의 단위금액이 소액이라는 점에서 신탁 운용의 경제성이 낮다. 민간 수탁기관을 통한 시장 기반의 자발적 확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신탁을 통한 수탁 방식으로의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송 연구위원은 "고령자의 신체적·인지적 기능 저하에 따른 재정관리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일반사망 이외의 정액형 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을 공공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신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신탁을 통한 보험금청구권의 노후 생활비 및 간병비 구조화는 고령자의 자산을 목적지정 방식으로 활용함으로써, 공적 돌봄 재정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고령자나 인지기능 저하 우려가 있는 가입자에게 보험금의 안전한 관리, 목적 기반 사용, 가족 간 분쟁 예방 등 실질적 효익을 제공함으로써, 보험상품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고, 잠재 수요층의 확대 및 보험 가입 유인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