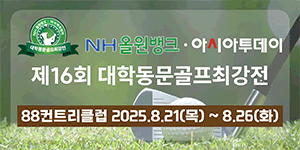AI매출 비중 가장 높은 곳은 SKT, 3.3%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 중 AI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의 AI 관련 매출은 2025년 1분기 기준 약 1472억원으로 전체 매출(4조 4537억원) 대비해선 약 3.3%로 아직 작지만 성장을 거듭 중이다. AIX는 전년 대비 27.2% 증가했고, AI 데이터센터 부문(AIDC)도 11.1%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매출구조 전환의 초기 단계지만 분명한 성과가 발생하고 있는 모습이다.
먼저 SK텔레콤은 지난해 발표한 'AI 피라미드 전략'을 올해 들어 수익 구조를 명확히 한 '2.0'으로 고도화했다. △AI 인프라 데이터센터(AI DC) △B2B 전용 AI 플랫폼(AIX) △Agentic AI 기반 개인 서비스(A.) 등 3단 구조로 정리해 실질적인 매출 확대 기반을 구축했다.
특히 AI DC는 GPU 클라우드, 전용형·모듈러형·하이퍼스케일 DC로 세분화했으며, 가산 AI센터에서 이미 상용 서비스 제공을 준비 중이다. AIX는 'A.Biz', 'A.Biz Pro' 등 그룹 계열사 대상 업무 자동화·지능화 도구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B2C 영역에서는 가입자 890만 명을 확보한 '에이닷'과 미국 출시 예정인 글로벌 AI 서비스 '에스터'를 통해 개인용 AI 시장도 공략한다.
KT 역시 AI 및 클라우드 기반 사업 매출이 확대하고 있다. 2025년 1분기 기준 AI부문 매출은 약 892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10.2% 증가했으며, 전체 매출(6조 8451억원) 중 약 1.3% 수준을 차지한다.
KT는 한국형 AI 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하며 정책과 기술의 접점을 노린다. 자체 초거대언어모델(LLM) '믿음 2.0'을 최근 공개하며 허깅페이스에 오픈소스로 게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믿음 2.0은 한국어에 최적화된 고품질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약 200개 카테고리로 데이터 분류·정제해 정확도를 높였다. 한국어·영어를 모두 지원하고, 문장의 구조를 AI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체 토크나이저까지 설계했다. 대화의 뉘앙스, 감정, 의도까지 해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으며, Ko-Sovereign 등 한국형 AI 벤치마크에서도 경쟁 모델 대비 우수한 성능을 기록했다. KT는 "데이터 주권, 사용자 선택권, 한국적 가치, 책임 있는 운영"이라는 4대 철학을 내세우며,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참여를 공식화했다. 일부 부족한 기술은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력 중이지만, 전체적인 구조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AI 및 IDC 중심의 인프라 사업에서 2025년 1분기 기준 약 118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전체 매출(3조 7481억원) 대비 약 3.2%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직은 비중이 미미한 수준이지만 보안 기술과 온디바이스 AI 고도화 성과가 기대된다는 평가다.
LG유플러스는 통신사 중 유일하게 'AI 보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익시오(ixi-O)' 서비스에 세계 최초로 온디바이스 기반 '안티딥보이스(Anti-DeepVoice)' 기술을 상용화하며, AI 보이스피싱 탐지 시대를 열었다. 이 기술은 약 200만 건, 3000시간 분량의 통화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상대방 목소리의 주파수·패턴 왜곡을 5초 이내 탐지해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이다. 음성 인식(VAD), 텍스트 전환(STT), 스푸핑 분석 등의 모듈을 통합해 구현했으며, 모든 연산은 스마트폰 내에서 이뤄지는 온디바이스 구조로 설계돼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없다. 여기에 딥페이크 영상 탐지 기술 '안티딥페이크'도 추가해 AI 합성 영상의 픽셀 흔적, 프레임 불균형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국과수와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음성 패턴을 실시간으로 매칭하는 기술도 개발 중이다. 통화 전 단계에서 보이스피싱 위험 번호를 AI가 사전 식별하는 기술까지 포함되며, 향후 금융권 협업을 통한 범죄 예방 모델로 확장될 예정이다.
정부가 AI 기반 산업·공공 서비스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주요 기관과 민간 기업의 AI 내재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통신 3사의 전략은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정보 주권' 확보라는 국가적 의제와 맞닿아 있다. 업계관계자는 "AI는 단순한 사업 영역이 아니라 국가 기술 자립과 사회적 신뢰 기반을 동시에 갖춰야 하는 전략 산업"이라며 "통신사들의 움직임이 향후 국내 AI 생태계의 뼈대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