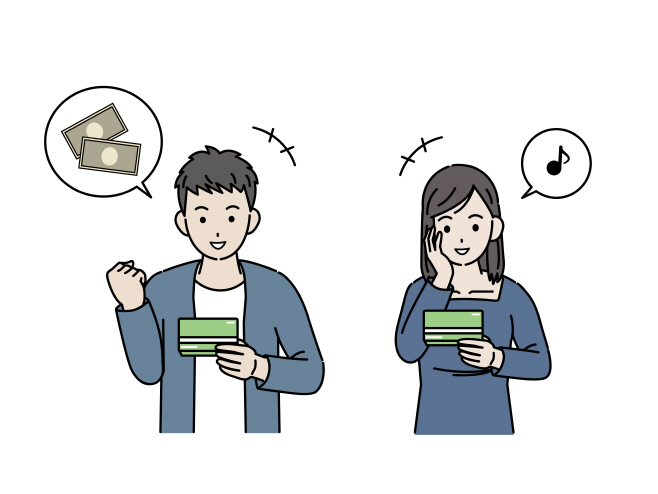은행권도 맞춤형 단기 상품 경쟁…유입 효과 노려
|
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6개월 미만 정기예금 잔액은 올해 5월 말 196조596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186조440억원)보다 5.7% 늘어난 규모다. 반면 같은 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정기예금 잔액은 32조6108억원에서 23조136억원으로 감소했다. 향후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처로 이동하기 위해 예·적금 만기를 짧게 설정하는 이들이 많아진 영향이다.
특히 2030세대는 장기간 자산을 묶어두기보다 필요할 때 유동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수시입출금식 예치나 단기 적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청년들이 오히려 소액부터 차근차근 모으려는 목적으로 단기 예금을 많이 찾는다"며 "언제 돈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짧게 넣어두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사회초년생 조유진씨(25)는 "목돈을 그냥 묵혀두기보다 예금 상품으로 이자를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면서도 "상경 후 아직 거주가 불안정한 데다 취업이나 이사 등으로 언제 자금이 필요할지 몰라 장기 예금보다 단기 상품을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기 예금에 대한 회의감이 단기 선호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 대학생 문정후씨(24)는 "예전에 3년짜리 적금에 들었다가 돈이 부족해 중간에 해지한 적이 있는데, 그 뒤로는 불확실한 상황에 맞춰 짧게 운용하는 습관이 생겼다"며 "어차피 장기 예금이라고 해도 금리 차이가 크지 않아 굳이 오래 묶어둘 필요를 못 느낀다"고 덧붙였다.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금 상품은 과거만큼의 투자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청년층에게는 일정 수준의 안정성과 이자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부담이 적은 금융 수단으로 인식된다. 특히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사회초년생이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고 단기간 내 혜택을 체감할 수 있어 실용성이 높은 편이다.
은행권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단기 수요에 맞춘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한 달간 꾸준히 적립하면 LG전자 가전 구독료를 지원하는 '한달적금 with LG전자'를 출시했고, 케이뱅크도 한 달 만기의 '궁금한 적금'을 선보였다. 높은 금리를 내세우며 적극적인 수신 유치를 노리는 저축은행업권도 마찬가지다. SBI저축은행은 6개월간 월 10만원 납입 시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사이다뱅크 커피적금'을 출시했다.
강윤정 KB경영연구소 연구원은 "20대는 브랜드 충성도가 낮고 금융 습관이 고정되지 않은 시기"라며 "한시적 이벤트나 우대금리 마케팅을 통해 초기 진입을 유도하는 전략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상품 출시 이후 상품성 유지와 혜택 관리가 뒷받침돼야 지속적인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