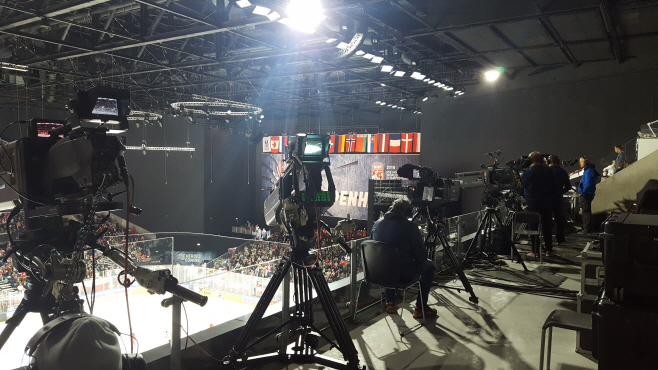KBO·K리그 관중 신기록에도 구조적 격차는 여전… 산업적 전환이 관건
|
경기가 끝난 뒤 근처 식당이 붐비고, 지하철 승객이 몰리며, 소셜미디어에는 수많은 사진과 영상이 공유된다. 경기장은 단순히 승패를 겨루는 공간이 아니라 경제적 흐름이 응축되는 무대다. "스포츠=비즈니스"라는 명제는 오늘날 스포츠를 설명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언어다.
글로벌 시장에서 스포츠는 이미 초대형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글로벌 컨설팅사 케어니(Kearney)는 최신 보고서에서 세계 스포츠 시장 규모를 2025년 약 4,170억 달러(한화 약 580조 원)로 추산하고, 2030년에는 6,020억 달러(약 830조 원)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PwC 역시 이미 글로벌 스포츠 산업이 6,000억 달러(약 830조 원)를 넘어섰다고 평가하며, 2026년까지 연평균 8.7%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망치와 기준 시점에 따라 수치는 다르지만, 두 기관 모두 스포츠 시장을 단순한 여가 산업이 아닌 수백조 원대의 초대형 산업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한다. 이는 스포츠가 더 이상 오락의 차원을 넘어 글로벌 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외 주요 리그의 사례는 이 산업의 스케일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는 전 세계 축구 산업의 정점에 서 있다. 2022~2025년 3개 시즌을 대상으로 한 방송권 계약에서 EPL은 사상 처음으로 해외 중계권 수입이 국내 중계권을 앞질렀다. 국제 중계권 총액은 약 53억 파운드(약 95조 원), 국내 중계권은 51억 파운드(약 92조 원)에 달했다. 이는 단순한 수치의 차이를 넘어, 영국 리그가 자국 시장보다 해외에서 더 큰 가치를 창출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아시아와 북미, 중동,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서 EPL이 소비되는 규모가 영국 내 수익을 능가하면서, EPL은 더 이상 '국내 리그'가 아니라 사실상 '지구촌 리그'로 자리매김했다.
2025/26시즌부터 적용된 새 방송권 계약에서 EPL은 4년간 영국 국내 중계권만으로 총 67억 파운드(약 120조 원)를 확보했다. 단순히 금액이 늘어난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케이블 TV 시청자 감소와 미디어 시장 위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EPL은 핵심 수익원인 국내 중계권에서 가치 하락을 막아냈을 뿐 아니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경쟁 구도조차 뚜렷하지 않았음에도 기존 사업자와의 재계약을 통해 금액을 끌어올린 것은 EPL 콘텐츠가 지닌 독보적 가치를 다시 한 번 증명한 사례다.
이와 동시에 해외 시장의 성장세는 더욱 가파르다. 직전 계약에서 53억 파운드였던 해외 중계권 수익은 다음 계약에서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EPL은 국내권에서 '안정'을, 해외권에서 '성장'을 동시에 확보하며 전체 리그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야말로 EPL이 세계 축구 산업에서 독보적 지위를 유지하는 힘이다.
|
야구 역시 전통적 방송권과 디지털 플랫폼을 결합하며 수익 다변화를 실험하고 있다. MLB는 FOX, Turner와의 대형 계약을 유지하는 한편, ESPN은 2025시즌 종료 후 기존 전국 중계권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대신 ESPN이 MLB.TV 등 아웃오브마켓 중계 유통에 참여하는 방안이 협의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MLB.TV는 리그가 직접 운영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로, 전 세계 팬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MLB의 사례는 미국 스포츠가 방송권과 디지털 전환을 동시에 활용하며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관중 증가와 함께 입장권 수입도 동반 상승했다. 2023시즌 K리그1·2의 입장권 수입은 344억 원으로 공식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24시즌에는 4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5% 증가했다. 흥행과 매출이 동시에 성장하는 흐름은 산업적 전환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프로야구의 성과는 더욱 두드러진다. 2024시즌 KBO리그는 총 1,088만 7,705명의 관중을 기록하며 역대 최초로 시즌 관중 1,000만 명을 돌파했다. 2017년 약 84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었던 리그가 불과 몇 년 만에 반등에 성공해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이다. 팬데믹 이전 기록을 단숨에 넘어서는 수치로, 한국 프로스포츠가 다시금 대중적 기반을 확고히 했음을 보여준다.
|
한국 스포츠 산업의 가장 큰 약점은 여전히 단순한 수익 구조다. 구단 매출의 상당 부분이 티켓 판매와 스폰서십에 의존하며, 안정적이지만 확장성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다만 최근 몇 년간 중계권 시장에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KBO는 2019년 체결한 뉴미디어 계약이 연평균 220억 원 수준이었으나, 2024년 티빙과 새롭게 맺은 계약은 3년간 1,350억 원(연평균 45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지상파 3사와의 계약까지 합치면 프로야구 전체 중계권료는 연간 1,000억 원을 넘어서는 규모로 확대됐다. K리그 역시 2022년부터 쿠팡플레이와의 독점 계약을 통해 OTT 중심으로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중계권 수입이 135억 원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빅리그와의 격차는 압도적이다. EPL은 국내외 합산 연간 수조 원대의 중계권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NBA는 2025/26시즌부터 새롭게 적용될 차기 계약으로 연간 약 69억 달러(약 96조 원)를 벌어들이게 된다. 이 차이는 단순히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스포츠를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구조적 기반의 차이를 보여준다.
그렇다고 전망이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한국 스포츠는 분명히 변곡점에 서 있다. 축구와 야구 모두 관중 기록을 새로 쓰고 있고, 입장권 수입은 꾸준히 상승 중이다. 농구, 배구 등 다른 프로스포츠 종목들도 관중 증가세를 보이며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을 어떻게 산업적 기반으로 전환하느냐다. 관중의 열광을 일회성 흥행으로 끝내지 않고, 장기적인 수익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해외 리그들이 보여주듯, 안정적인 수익 구조와 체계적인 산업 기반이 마련돼야만 문화적 감동도 지속될 수 있다. 스포츠는 결국 감동의 무대다. 그러나 감동은 산업적 기반이 뒷받침될 때만 지속된다. EPL의 경기력 뒤에는 수십억 파운드의 중계권 수익이 있고, NBA 슈퍼스타들의 화려한 플레이 뒤에는 수조 원대 방송 계약이 있다. 산업이 튼튼해야 문화가 지속된다. 스포츠를 시장의 언어로 읽는다고 해서 그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비즈니스적 토대가 있어야 팬들이 더 오래, 더 깊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이처럼 "스포츠=비즈니스"라는 명제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구조적 현실임을 확인했다. 세계 시장은 이미 수백조 원 단위로 움직이며 중계권, 스폰서십, 머천다이즈를 축으로 선순환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티켓 수입과 스폰서 의존도가 높은 불완전한 구조에 머물러 있다. 이는 산업적 자립과 확장 가능성을 제한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도 제약이 될 수 있다. 숫자가 말해주듯, 스포츠를 감동의 무대에만 머무르게 할 것인가, 아니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성장시킬 것인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