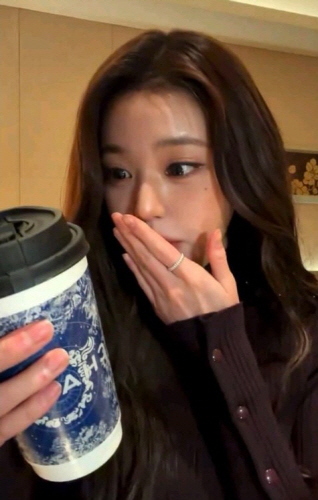|
이런 생각의 바탕에는 ‘저축의 역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 만약 최종생산물에 대한 소비가 100에서 80으로 줄어들고 20만큼의 저축이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 ‘저축의 역설’ 주창자들은 비록 20만큼 더 투자를 해서 생산이 늘어나더라도 최종소비가 줄어들어 늘어난 상품을 팔 수 없어 경제가 파탄에 이른다고 봤다.
“저축으로 인해 소비가 종전보다 줄어들면, 자신의 상품에 대한 수요의 감소에 직면한 기업가는 투자와 고용을 줄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만성적인 과소소비가 경제를 파탄으로 이끈다는 이런 종류의 두려움은 오랜 것으로 케인즈 이전에도 ‘과소소비설’로 불렸다. 과소소비설은 이렇게 묻는다. “소비가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생산재에 대한 투자 증대가 이윤이 남는 일이 될 수 있는가?”
이처럼 ‘저축의 역설’과 관련된 우려 자체는 경제학에서 다룰 중요한 질문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는 엄밀한 경제이론이 있지만(Garrison, Time and Money, 2000) 상당수의 경제학자들조차 그런 줄 모른다는 데 있다. 설명의 핵심은 늘어난 저축 20이 그 경제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데 있다.
늘어난 저축이 자본시장에 들어오면 이자율이 낮아져 기존투자뿐만 아니라 투자의 최종 결실까지 시간이 더 걸리는 기술이 시도되거나 더 모험적인 투자도 해볼 만해진다. 이로 인해 더 많아지거나 새로운 생산물에 대한 소비는 소비자들의 저축, 즉 미래의 소비를 위한 재원의 증가에 의해 충당된다.
저축의 역설 주창자들은 정부의 적자재정 지출이 ‘반드시 필요한 일’로 보지만, 이들 중 일부는 정부가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퍼주기’ 예산을 짜는 것을 두고 베네수엘라와 같은 나라처럼 경제가 ‘폭망’하게 될까 우려하기도 한다. ‘저축의 역설’ 주장에 따르면 만약 베네수엘라처럼 정부가 선심성 복지정책을 써서 더 많이 나눠 주더라도 그것이 최종 소비재 수요를 늘리고 수요 증가에 대응해서 기업가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지 않겠는가. 그런데 왜 베네수엘라 경제는 ‘폭망’했는가?
이는 이렇게 설명된다. 베네수엘라 정부의 선심성 지출은 결국 세금을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을 통해 국민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낮춘 ‘인플레이션 조세’가 대표적이다. 그런 세금은 민간이 저축할 여력을 없앤다. 결국 정부의 ‘비생산적’ 적자재정지출이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이기는커녕 그나마 존재하던 민간의 잠재적인 투자재원의 저수지를 말려버린다는 것이다.
현재의 저축은 미래의 소비를 위한 것이다. 케이크를 먹으면서도 케이크가 그대로 남아있기를 바랄 수는 없다. 현재의 소비를 늘리면 그 대가로 미래의 소비는 감소시키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저축의 역설’ 주창자들은 현재의 소비가 미덕이라고 치켜세운다. 미래에 소비할 여력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고 당장의 소비만이 중요하다. 심지어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뿌려 민간의 최종소비를 늘리는 게 ‘오묘한’ 경제처방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정부의 빚은 결국 민간이 세금으로 갚아야 하고, 이는 민간의 미래 소비 여력을 없앨 것인데도 말이다.
어느 생각이 현실에 부합하는가? 이에 대한 올바른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이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없으면, 민심의 풍향에 따라 언제라도 우리가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를 탈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