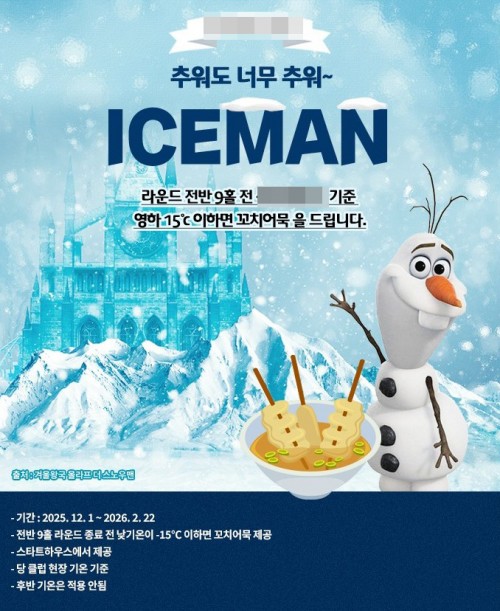스웨덴도 재정 안정 대가 커
한국, 전환 비용만 2700조원
|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DC 방식은 해외 여러 국가에서 도입됐지만, 노후 보장 실패와 높은 사회적 비용을 남긴 채 다시 공적연금 체계로 회귀하는 사례가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국민연금의 확정기여방식 전환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서 DC 방식 전환을 시도했던 해외 사례를 심층 분석했다.
현행 '확정급여(DB) 방식'은 국가가 일정 수준의 연금액을 보장하지만, DC 방식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투자 수익률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지는 구조다. 겉보기엔 개인의 선택권 확대와 수익성 제고라는 장점이 있어 보이지만, 해외 경험은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1980년대 칠레를 시작으로 아르헨티나, 헝가리 등이 DC 방식으로 전환했지만, 공통적으로 막대한 '전환 비용'이라는 벽에 부딪혔다. 기존 연금 수급자에게는 약속된 연금을 계속 지급하면서도 새로운 가입자의 보험료는 개인 계좌로 전환해야 해, 국가 재정에 국내총생산(GDP)의 4%가 넘는 부담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민간 금융회사가 부과하는 높은 운용·관리 수수료도 문제로 지적됐다. 아르헨티나에선 보험료의 절반 이상이 수수료로 빠져나가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후소득의 불안정성이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연금 자산 가치가 폭락하면서 은퇴를 앞둔 수많은 가입자가 빈곤 위기에 내몰렸다. 투자 손실을 개인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DC 방식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난 셈이다. 이후 이들 국가는 다시 공적연금 체계로 회귀하는 '재개혁'에 나섰다.
DB와 DC의 절충안으로 알려진 '명목확정기여(NDC)' 방식을 채택한 스웨덴의 사례도 완벽한 대안은 아니라는 평가다. NDC는 국가 재정 상황에 따라 연금액이 자동 조정돼 재정 안정화에 기여했지만, 연금 수령액 자체는 줄어드는 구조다.
기대수명이 늘어날수록 연금액이 감소하는 설계 탓에, 스웨덴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2022년 30.8%에서 2070년 25.5%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노인 빈곤율도 2005년 9.5%에서 2022년 17.2%로 크게 상승했으며, 여성 노인의 빈곤율은 20.4%에 달했다. 정부는 결국 막대한 재정을 들여 최저소득 보장 제도를 추가 도입해야 했다.
보고서는 세계 최저 출산율과 초고속 고령화라는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DC 방식 도입은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진은 국민연금을 DC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필요한 재정 규모를 약 2727조원으로 추산했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DC 방식으로의 전환은 사회적 연대와 위험 분담이라는 사회보험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재정 안정이라는 명분 뒤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금 개혁은 현행 DB 체계를 유지하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 개혁'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다. 급진적인 구조 개편보다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교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