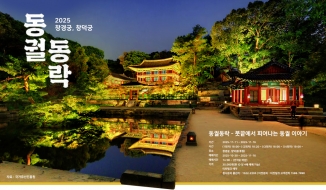|
"한 국가의 통치자로 군림하기 위해선 막강한 군사력과 행정력만으론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수 대중이 통치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을 테니까요. 광활한 영토를 가진 거대한 제국의 황제라면 더더욱 다지역, 다민족, 다언어, 다문화의 다수 군중을 끌어당길 수 있는 강력한 구심력이 필요하겠죠. 황제 개인의 강력한 카리스마나 먼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만으론 장구한 세월 제국의 질서가 유지할 순 없겠지요. 제국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황제는 다수 대중을 향해 보편적 가치를 제시하고, 역사의 방향을 알려주고, 나아가 인류의 정도를 제시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군주는 스스로 인격신이 되려 하겠지만, 현명한 군주는 조로아스터, 부다, 공자, 예수와 같은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지 않을까요?"
◇ 제국의 국가 이성(raison d'etat)
제국의 통치가 긴 세월 유지되기 위해선 풍족한 경제력과 강력한 군사력 못잖게 드넓은 영토 다양한 집단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제국의 논리가 필요하다. 왜 여러 지역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황제 밑에서 살아가야만 하는가? 황제가 없이 여러 지역 많은 나라가 각자 군주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면 왜 안 되는가? 제국의 통치자는 이러한 근원적 물음에 대해 답할 수 있어야만 한다.
황제의 권위 앞에 자발적으로 부복하는 제국의 신민들을 길러내기 위해선 평범한 사람들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숭고한 가치와 원대한 목적과 보편적 이상(理想)이 필요하다. 진시황의 제국 프로젝트를 그대로 이어받은 한무제가 법가 사상 대신 유가 사상을 제국의 국교로 삼았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진시황은 스스로 절대적 권위를 창출하려 했지만, 한무제는 겸손하게 공자가 전한 유교의 가르침을 제국의 논리로 삼았다. 그 결과 진 제국은 15년 만에 멸망했지만, 한 제국은 400년 이상 유지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무리한 주장일까?
|
삼엄한 감시와 통제, 엄격한 형벌과 무차별적 처벌, 마키아벨리적 권모술수를 일러주는 법가 사상은 유용한 통치술은 될 순 있겠지만, 절대로 다수 군중의 자발적 복종과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보편적 가르침이 될 수는 없다. 법가는 군주의 통치술이 될 순 있어도 백성에게 삶의 의미와 국가의 목적을 일깨우는 아름다운 가르침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비자(韓非子)'의 '난언(難言)'에는 "술장어흉(術藏於胸)"이란 말이 나온다. 군주는 통치의 술수를 언제나 가슴 깊이 간직해야 한다는 말이다. 군주가 통치술을 들켜버리면, 민심은 떠나가고, 등 돌린 신하들은 호시탐탐 찬탈의 기회만 노릴 뿐이다.
진시황은 분명 한비자의 간지(奸智)와 이사(李斯)의 술수(術數)를 받아들여 천하를 통일했지만, 진 제국은 단명하고 말았다. 신하와 백성이 모두 법가 사상의 늪에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제국이 오래도록 존속하려면 군주는 법가의 현실주의를 가슴 깊이 숨기고서 유가의 이상주의를 표방해야만 한다. 유교는 인의예지(仁義禮智)와 같은 보편적 가치, 제세안민(濟世安民), 협화만방(協和萬邦)과 같은 원대한 목표, 왕도정치(王道政治)나 대동(大同)세계와 같은 숭고한 이상을 설파했다. 진시황의 법제를 계승했음에도 한무제가 유가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선포한 까닭이 진정 거기에 있으리라.
삶의 목표를 상실한 개인은 자살에 이르고 만다. 목표도 이상도 없는 국가는 파멸을 면할 수 없다. 진정 그러하기에 한무제는 유교를, 인도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대왕은 불교를,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대제는 기독교를 국교(國敎)로 삼았다. 유교, 불교, 기독교 등 위대한 스승의 큰 가르침을 내세웠기에 전통 시대 제국들은 장기간 존속될 수 있었다. 숭고한 이념을 상실한 국가는 폭력 조직으로 전락하고 만다. 보편적 가치, 원대한 목표, 숭고한 이상을 내세우기에 국가는 인민의 금품을 강탈하는 범죄 조직과 달리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세금을 걷을 수가 있다.
|
마르크시즘의 세례를 받은 중국의 역사가들은 권위에 대한 복종을 설파하는 유교의 가르침이 황제의 지배를 강화한다고 주장한다. 삼강오륜(三綱五倫) 등의 유가적 가치는 군주와 가부장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을 강요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그런 면이 전혀 없다고 할 순 없지만, 유교를 표방하는 군주 역시 유교의 가르침에 구속될 수밖에 없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유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늘은 자연의 이치를 어기고 인간의 도리를 배반한 군주를 절대로 살려두지 않기 때문이다. '상서(尙書)'에는 하늘은 오직 백성의 눈과 귀를 통해서 보고 듣는다는 말이 나온다. 제아무리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군주라 해도 폭정을 일삼으면 권력을 잃고 만다. 군주에게 권력을 부여한 하늘의 명령은 언제든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바로 '천명미상(天命靡常)'의 가르침이다. 제국의 황제라 해도 실정을 거듭하여 학정을 일삼으면, 반드시 정권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발생하여 왕조 교체에까지 이르고 만다는 준엄한 교훈이다. 하나라 독재자 걸(桀)은 하나라의 봉건 제후였던 성탕(成湯)에 토벌당했고, 상나라 최후의 폭군 주(紂) 역시 상나라 봉건 제후였던 희창(姬昌, 주문왕)과 그 아들 희발(姬發, 주무왕)이 800 제후들을 규합하여 만든 연합군에 정벌당했다.
사마천(司馬遷) '사기(史記)의 '주본기(周本紀)'를 보면, 무왕이 목야(牧野)에서 독재자 주왕을 사로잡아 참수하고 그 머리를 흰 깃대에 매달았다는 대목이 나온다. 유가 경전은 하나라의 어리석은 군주 걸왕(桀王)을 물리치고 상나라를 세운 탕왕(湯王), 상나라의 잔혹한 군주 주왕을 척살하고 주나라를 세운 무왕(武王)을 제세의 영웅으로 기린다. 유교를 선양하는 모든 군주는 방심하면 스스로 효수당한 독재자 주왕의 운명에 처할 수 있음을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면서 자라났다. 바로 그 점에서 유교는 권력 강화의 수단이면서 동시에 권력 찬탈의 근거가 될 수도 있었다. 유가 경전은 폭군을 몰아내고 스스로 황제가 되려는 야심가에겐 왕조를 교체하는 역성혁명(易姓革命)의 논리를 제공했다.
예나 지금이나 천리를 저버려 민심을 잃은 통치자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유가의 가르침은 흉악한 독재자를 제거하는 정치 혁명을 정당화한다. 바로 그 점에서 유교는 통치자에 대한 맹목적 복종을 강요하기보단 권력을 감시하고, 제약하는 헌정적 기능을 발휘했다.
송재윤 맥마스터 대학 역사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