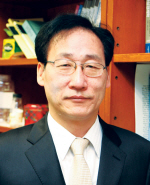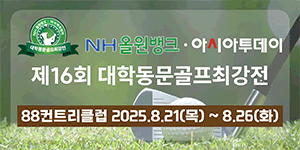|
주지하듯이 대공황은 1920년대 말 증권시장의 붕괴로 징후가 나타나 제2차 세계대전 발발 때까지 이어진 장기 경제침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공황 같은 경제위기의 도래를 경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덕분에 자본주의가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통설 탓인지 ‘디지털’ 뉴딜 등의 새로운 이름으로 대규모 적자 재정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딜이 과연 성공했는지 분명하지 않고 오히려 실패했다는 견해도 많습니다. 1930년대에 이미 헨리 해즐릿이나 존 T. 플린 등이 뉴딜 정책은 실패했다고 봤고, 2000년대에도 UCLA의 콜(Harold Cole)과 오헤이니언(Lee E. Ohanian) 같은 주류경제학자들도 뉴딜이 대공황을 더 오래 끌게 했다는 “스스로 놀란” 분석을 내놨습니다.(2004년 8월,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주요 통계만 봐도 뉴딜 정책이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루스벨트 행정부의 7년간의 노력에도 1인당 GDP는 1929년의 857달러에서 1939년에는 847달러로 감소했고, 대공황 전 약 3%던 실업률이 1939년에는 17.2%에 달했습니다. 또 순(純)민간투자는 1930-40년 동안 31억 달러 줄어들었습니다. 적자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펌프에서 민간의 투자가 샘솟아 넘쳐나기는커녕, 오히려 말라붙어 버린 것입니다.
통계를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대공황 당시 루스벨트 행정부에서 뉴딜 정책을 집행한 헨리 모겐소 주니어(Henry Morgenthau Jr. 1891-1967) 재무장관의 절규에 가까운 다음 고백만 들어봐도, 뉴딜이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돈을 쓰려고 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지만 먹히지를 않는다. 나의 관심사는 단 한가지다.…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먹을거리가 있는 것을 보고 싶다. 여태 우리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이 행정부에서 8년간 일을 했는데도 실업자들은 우리가 일을 시작할 당시만큼 많다. 게다가 갚아야 할 빚도 엄청나고!”(머피, 《대공황과 뉴딜정책 바로알기》 142)
미국의 제2차 세계대전 참전으로 실업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뉴딜과 같은 적자 재정정책 덕분이 아니라 실업자들이 전쟁터로 갔기 때문입니다. 과감한 적자 재정정책이 없던 캐나다가 미국보다 더 빨리 경기침체로부터 회복한 것에 주목해서 적자 재정정책이 오히려 경제 회복을 늦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세계 각국이 정치적 이유 등으로 막대한 적자 재정정책을 동원하고 있지만, 이들 간의 진정한 경쟁은 “누가 고육책인 적자 재정정책을 덜 동원하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가?”로 보입니다. 엄격한 재정준칙을 가진 독일은 물론이고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유럽의 ‘재정모범 4국(Frugal 4)’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이로 인한 빚을 후대에 넘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돈을 쓰자고 합니다.
이에 반해 재정파탄 상태의 남유럽 4국(PIGS)은 유럽연합(EU) 책임 아래 코로나19 채권을 발행해서 각국이 지출하자고 합니다. 결국 재정이 건전한 타국의 부담으로 자국의 재정을 지출하려는 속셈인 남유럽국가들에 비해 이에 반대하는 독일과 재정모범국가들의 미래가 훨씬 더 밝아 보이는 게 필자만이 아닐 겁니다. 홍 부총리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