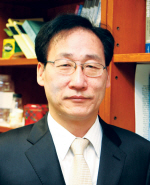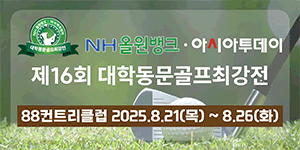|
이런 ‘간섭의 악순환’의 고전적 사례를 꺼내는 것은 현재 여당이 ‘이익공유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은행이자규제특별법’이 현대판 ‘사료가격 통제’이기 때문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9일 인터뷰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성과를 못 거둔 게 많은 임대인들이 은행 부채를 가지고 있고 계속 은행 이자를 내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유가격 통제가 성과가 없었던 게 축산농가가 높은 사료가격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과 닮았다.
이런 논리 아래 홍 정책위의장은 “금리를 낮추거나 은행 이자 (납부를) 중단시키거나” 혹은 올 한 해 동안 “개인 신용등급 인하(이에 따른 이자부담 인상)”와 “가압류, 근저당 등의 방식”을 멈추는 사회운동,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익공유제’란 말을 꺼낸 이낙연 대표가 신중해야 한다고 했고 아직 공식논의가 된 적이 없다고 했지만, 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의 발언이기 때문에 가볍게 보기 어렵다.
물론 오랫동안 재화의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이들조차 ‘이자율’은 ‘가격’이 아니어서 통제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이 그런 오해를 깨트리고 ‘이자율도 하나의 가격’이고 이를 통제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일깨웠다. 이자는 원금의 상환 이외에 더 붙는 화폐의 수량이다. 여기에는 ‘시간’이 개재된다. 현재의 화폐 1000만원을 주고, 1년 후의 화폐 1030만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는다. 1000만원을 쓸 기회를 1년간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원금에 더해 30만원의 보상을 받는다. 이 교환비율 3%는 시장에서의 다른 교환비율과 마찬가지로 엄연히 ‘가격’이다. 3% 이자율에서 빌리려는 총액이 빌려주려는 총액보다 많으면 이자율이 더 올라가서 둘의 균형을 맞춘다. 가격통제는 이런 조정 과정을 방해한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대출자와 대부자를 중개한다. 개인들이 서로 빌리고 빌려줄 수 있겠지만, 채무변제 능력 확인, 계약 준수 확보 등이 어렵다. 그래서 지급능력을 검토할 전문가가 있고, 떼일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은행들이 금융 중개업을 하고, 개인들은 이자율이 낮더라도 개인보다는 은행에 빌려주게 되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겠다면서 각국 정부가 저금리 정책으로 돈을 풀고 있다. 그 결과 실물 경제는 어려운데 주식 등 금융시장만 달아오르고 있어 자칫 금융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각국 중앙은행들이 긴장 속에 지켜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은행 등에게 벌어들인 이익을 배당을 통해 나눠주기보다는 혹시 있을 손실에 대비토록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익공유제’와 그 수단으로 이자율 규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된 게 아니라고 하니 이자율 규제 발상을 아예 접어야 한다. 그런 규제로 ‘간섭의 악순환’에 빠지면 은행업이 피폐해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서민들의 금융기관 이용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고 홍콩에 있던 금융회사들이 서울로 오기는커녕 서울에 있던 외국 금융회사조차 떠나게 만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