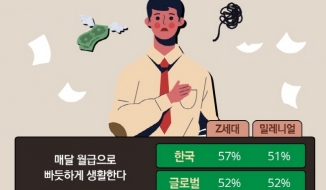보수 "한반도 통일 동북아시아 통합 촉진, 그 중심에 통일한국을 세울 것"
진보 "남북한 어느 정권이든 급속한 통일 내세우면 역내 충돌 부를 것"
|
이번 포럼은 ‘외세시대에서 남북시대로, 분단현대사에서 통일현대사로’라는 슬로건 아래 한반도 냉전체제를 청산하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평화 공존체제로 전환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울란바토르 포럼에서는 50여명이 넘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와 통일 담론을 유라시아 현장에서 토론을 벌이고 있다. 포럼은 △세션 1 : 개막포럼 △세션 2 : 한반도 냉전 체제와 남북 대치 메카니즘 △세션 3 : 한반도 국제정치와 당사국 지위와 역할 △세션 4 : 한민족공동체 형성과 통일담론 △세션 5 : 한반도와 유라시아 관계 △세션 6 : 통일로 가는 길 화해와 상생 등 6개 세션으로 진행되고 있다.
23일 오전과 오후 진행된 1~3 세션을 지상 중계한다.
◇이인제 새누리당 국회의원
국제적인 대학·연구기관들은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과 붕괴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북한의 후견국으로 알려져 왔던 중국조차 “중국이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을 포기하하지 않을 것이라는 북한의 오판을 불식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 면모를 바꿔가고 있다.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시아 통합을 촉진하고, 그 중심에 통일한국을 세우게 될 것이다. 통일 독일이 유럽통합의 기관차였다면 동북아 통합의 기수는 우리가 중심 역할을 맡을 수 있다. 통일한국·중국·일본·몽골 그리고 극동 시베리아가 통합으로 나아간다면 세계경제의 중심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현재 한·중·일 세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미국을 능가하고 유럽연합(EU)를 필적한다.
이렇게 팽창하는 경제영역 가운데서 한국인 특유의 창조력과 역동성으로 새로운 성장의 시대를 연다면 우리 문제뿐 아니라 아시아가 안고 있는 난제인 ‘아시아 패러독스’까지 발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
미국은 미-중 대결을 핵심으로 하는 ‘아시아 회귀’ 전략에 따라 한·미·일 군사동맹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 동아시아 평화의 중대한 걸림돌로 제기되고 있는 일본의 과거사 왜곡과 침략 정당화, 한·일관계 악화는 미국에게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은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박근혜정부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또 한국과 중국의 교역 확대 때문에 한·미·일 군사동맹은 한국경제에 위기를 부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펼쳐야 한다. 한국은 급속하게 통일을 추진하려는 욕구를 버리고 남북 평화공존
과 동아시아 평화경제공동체를 추구해 나간다는 것을 대내외에 선포할 필요가 있다. 지금으로서는 남·북한 한국 내의 어느 정권이든지 ‘통일’을 내세울 경우 국내외의 갈등과 대립만 불러일으킨다.
◇김경웅 전 통일부 남북회담 대표
중국의 사회과학원은 ‘2014년 아시아·태평양 지구 발전 보고서’에서 △향후 5~10년 통일 문제가 남·북한 관계의 핵심이 될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과정에서 중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북한의 오판을 불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대학과 연구기관에서는 ‘한국 주도의 평화통일’과 ‘북한체제의 붕괴 가능성’을 공개 거론하는 가운데 중국의 국책연구기관인 사회과학원이 중국 정부가 앞으로 남북통일에 대해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은 의미가 크다.
|
◇체 바트바야르(Ts. Batbayar) 몽골 외교통상부 정책기획연구국장
몽골 외교정책의 주안점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두 강대국인 러시아와 중국과의 선린 우호 관계를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몽골은 국가의 생존 차원에서도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어느 나라에도 치우치지 않은 균형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만약 몽골이 두 나라 중 한 나라에게 쏠린 외교정책을 구사한다면 역내 충돌과 국익에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
2011년부터 몽골은 이런 외교정책의 주안점을 좀더 변경시키는 결정을 하게 된다. 즉 두 인접국과의 균형외교는 그대로 유지한채 ‘제3의 이웃’, 즉 아시아태평양 국가인 미국·캐나다·호주 등과 동아시아·중앙아시아·동북아시아 등 유라시아의 중요 국가들과 전략적 연대와 안보 협력을 확장하기로 한 점이다. 전략적 국가와 미국과 캐나다 등과의 새로운 관계를 중시하게 됐다.
|
◇이창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 석좌교수
현재 동북아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중·러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며 밀월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과 블라디미르 푸틴 양국 지도자는 중·러 관계 및 북핵문제를 포함한 국제정세 논의에서 전면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 중국과 러시아는 경제안보의 신(新)밀월기를 구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외교는 미국과 일본에 치우친 외교보다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당사국으로서 자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통해 평화안정을 구축하고 적대 공조와 외세 의존적인 외교를 넘어 통일전략적 협력외교로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