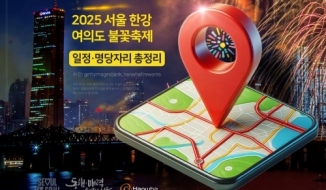60대 이상 건설기술인, 40대보다 많아져
외국인 근로자 비중도 지난해 기준 15% 육박
"외국인 비자 간소화·국내 인력 양성 등 필요"
|
건설업계 내부에선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 이미지는 물론 각종 사업장에 차질이 생겨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데, 과연 어느 누가 사고를 내고 싶어서 내겠나"라며 "근본적인 안전 문화 개선 없이 제재 강화만으로 사망 사고를 줄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인구 절벽에 따른 건설인력 고령화와 외국인 근로자 증가세 역시 안전 관리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라는 게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30일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건설기술인 103만5724명 중 60대 이상은 27만7432명으로, 40대(25만8143명)보다 많았다. 60대 이상 건설기술인 수가 40대를 앞지른 것은 연구원이 연령별 현황을 분석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처음이다. 2020년 당시만 해도 40대(29만9572명)가 60대 이상(14만7873명)보다 2배가량 많았던 것과 대조된다. 2033년에는 20·30대 건설 기술인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4.3%에 그칠 전망이다.
외국인 근로자 비중도 증가세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제도에 가입된 외국인 건설근로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 건설 현장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는 22만9541여명으로, 전체 건설근로자 156만여명의 약 14.7%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2020년(11.8%), 2021년(12.2%), 2022년(12.7%), 2023년(14.2%)에 이어 커지고 있다. 언어 장벽과 숙련도 저하 문제가 심화되며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외국인 숙련공 비자 요건 완화와 국내 건설 인력 양성 등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국내 건설현장에서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는 고용허가제(E-9)가 있으나, 이 제도는 3년 단기 체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단순 노무직만 가능해 숙련공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전문인력 활용과 체류 기간 갱신이 가능한 특정활동(E-7) 비자 중, 현장 숙련공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일반기능인력(E-7-3) 비자를 건설업종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