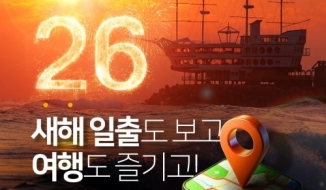韓전문가 "원자로 등 핵심기술 확보
2030년대 중후반엔 첫 진수 가능성"
농축·재처리 등 한미협정 개정이 관건
족쇄 풀리면 核생태계 선순환 시각도
|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부는 "원자로 및 무장 체계 등 핵심 기술을 이미 확보했다"며 "안전성 검증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고했다. 같은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방장관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했음을 재확인한다"며 "미 국무부·에너지부와 협력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5일 우리 국방부에서의 발언은 "한국의 강화를 승인했다(He approved Korea getting stronger)"는 트럼프식 표현과 맞물리며, 사실상 '한미 원잠 파트너십'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이는 한미가 공식적으로 '핵잠 협력'을 동맹 전략의 일부로 편입시켰음을 의미한다.
△ 원자로·무장 기술 확보… "핵연료만 남았다"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 (전 원자력 추잔 잠수함 개발(362 사업) 단장, 예비역 해군 대령)를 포함한 일부의 국내 잠수함 전문가들은 "핵잠의 핵심은 추진 원자로와 무장통합 기술인데, 이미 확보 중이며 검증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즉, 한국은 원자력발전소 운영 경험과 조선·방산 산업의 통합 역량을 기반으로 '한국형 원잠'의 기술적 토대를 완성했다는 것이다.
국내 조선업계와 방산기업들은 벌써부터 'K-SSN' 실체화를 전제로 기술·설비 점검에 착수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K2 전차·KF-21에 이어 'K-잠'이 국가 전략산업의 세 번째 축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 원자력 생태계 변화… 민·군 연계 시너지 주목
원자력추진 잠수함 추진은 단순한 군사 프로젝트를 넘어 국가 원자력산업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핵연료 사용 범위 확대, 농축우라늄 및 재처리 권한 논의가 본격화되면, 국내 원전·에너지 산업의 자립도가 급격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기술은 민간 SMR(소형모듈원자로)과 기술적 기반이 유사해, 원자력 생태계 전반이 탄력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제도적 과제 : 한미 원자력협정(123협정) 개정 필요
기술은 확보했지만, 제도는 여전히 족쇄다. 한국은 한미 원자력협정(123협정)에 따라 우라늄 20% 이상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제약을 받고 있다.
원잠 추진연료 확보를 위해선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예외 승인이 불가피하다. 협정이 완화되면 우라늄 농축·재처리 → 원전·방산 경쟁력 강화 → 조선·에너지 산업 확장으로 이어지는 '핵생태계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 2030년대 'K-원잠' 시대 열리나
전문가들은 2030년대 중후반 첫 함 진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다만 핵연료 확보, 미국 내 의회 승인, IAEA 체제 정비 등은 여전히 높은 장벽이다. 그럼에도 이번 발표는 "한국이 이미 기술적으로 문턱을 넘었다"는 상징적 선언이다. 한국형 원자력추진 잠수함은 단순한 무기체계가 아니라 국가 전략·산업·외교를 뒤흔들 '게임체인저'다. 이제 남은 과제는 정치적 결단과 제도적 조율뿐이다. 한미가 함께 설계한 이 미래 무기가 과연 2030년대 한국 해군의 주력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그 항로는 이미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