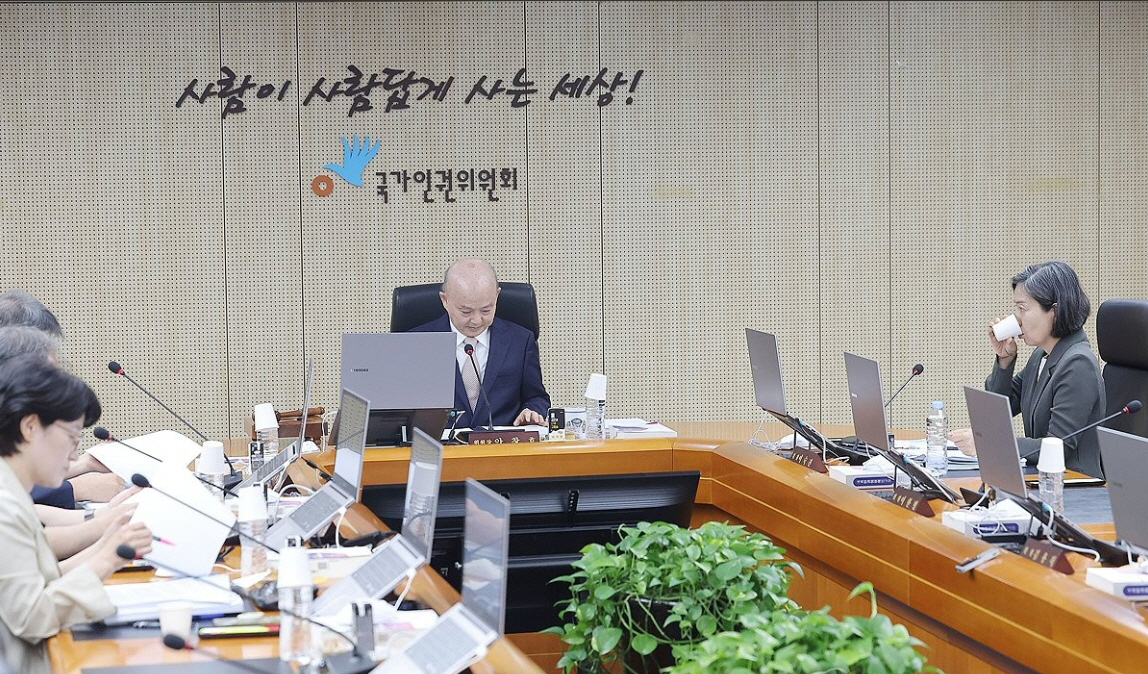후보자 선정 공개 검증 제도화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독립기구'라는 설립 취지와 달리 정권에 인사권이 종속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사회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 검증 절차를 통해 위원을 선출하는 해외 국가들과 대비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인권위원은 모두 11명(상임위원 3명)이다. 이는 대통령이 4명(상임위원 1명)을 직접 지명하고 국회가 선출한 4명(상임위원 2명),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식으로 구성된다. 형식상 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인사권을 나눠 갖는 형태지만 대법원장 임명 시기가 겹치는 경우 국회 야당 몫 2명(상임위원 1명)을 제외하고 최대 9명에게는 정부·여당 입김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정부·여당에 따라 중립성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9월 임명된 안창호 인권위원장 역시 범야권과 시민단체가 과거 소수자 혐오 발언을 이유로 부적격을 주장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
인권위는 다른 조직(입법·행정·사법)에 속하지 않은 법률상 독립기관으로 인권 침해 조사·정책 권고·차별 시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구성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인권위원 검증에 참여할 통로는 없다. 공개 검증 절차에 대한 조항이 없어 후보자 선정 과정은 비공개로 이뤄진다. 사실상 시민 통제 방안이 전무한 것이다. 인권위의 설립 근거인 유엔(UN, 국제연합) '파리 원칙'에 명시된 '투명하고 독립적인 인사 절차'와도 거리가 멀다.
반면 해외 주요 국가들은 시민사회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캐나다 인권위원회(CHRC)는 국회·법조계·시민사회가 함께 구성한 추천위원회가 후보를 검증한다. 호주 인권위원회(AHRC) 역시 법무부 장관이 형식상 제청하되 공개 모집과 청문 절차를 거쳐 후보를 확정한다.
서구권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에서도 인사 투명성을 제도로 보장한다. 인도네시아 인권위원회(Komnas HAM)는 인권 관련 필기시험과 공개 인터뷰를 하고, 점수와 추천 사유를 전체 공개한다. 몽골 인권위원회(NHRCM)는 국회 위원회 주관으로 생중계 청문회를 개최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질의가 가능하게 돼 있다.
국제 인권 기구에서는 우리 인권위도 이 같은 방식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는 2004년 이후 일곱 차례 심사에서 한국 인권위 인사 구조를 지적했다. 승인소위원회는 지난 2021년 인권위 등급 심사 과정에서도 "위원 선출 및 임명 절차가 불투명하고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정치권의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는 독립적인 후보 선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