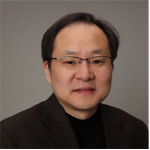|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부모와 학교, 전래동화나 드라마를 통해 이러한 도덕적 가르침을 끊임없이 자연스럽게 배운다. 부러진 제비 다리를 고쳐준 흥부와 욕심에 눈이 멀어 이를 일부러 부러뜨린 놀부, 정직함 덕분에 금도끼와 은도끼를 모두 얻은 나무꾼의 이야기는 우리 곁에 무수히 존재한다. 이 교훈은 이솝 우화에서도 반복된다. 거짓말 때문에 양 떼를 잃은 양치기 소년, 생쥐를 살려준 덕분에 목숨을 구한 사자, 여름 내내 개미를 비웃으며 놀다가 겨울에 추위와 배고픔에 떠는 베짱이의 이야기는 우리 무의식에 녹아있는 오래된 지혜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현실이 늘 인과응보·권선징악의 원리대로만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럼에도 어느 순간 목격하는 사건 앞에서 우리는 "그래도 옛말이 틀리지는 않았구나"라며 고개를 끄덕이곤 한다. 고단한 삶의 여정에서 자신이 지켜온 선한 선택이 완전히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받고, 잠시나마 위로를 만끽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몇 년 전 큰 반향을 일으킨 드라마 '더 글로리'는 그런 장면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학창 시절 학교폭력으로 심한 상처를 입은 주인공 문동은이 가해자 박연진에게 "용서를 빌라"고 요구하자, 연진은 이렇게 되묻는다. "용서? 누가 누굴? 아, 왜 없는 것들은 인생에 권선징악, 인과응보만 있는 줄 알까?" 이 대사는 단순한 악인의 오만을 넘어, 가난한 이들일수록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의 나락에서 '권선징악'이라는 관념에 매달리고, 부유한 이들은 그런 믿음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는 냉소를 담고 있다. 과연 인과응보는 약자들만의 자기 위안일 뿐일까.
사실 우리 사회에 인과응보·권선징악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을 더 강하게 공유하고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의 2025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는 이 질문에 객관적 수치를 제공한다.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의 63%가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문항에 동의했다. 인과응보·권선징악이 적어도 상당수 국민이 공유하는 도덕적 세계관임을 시사한다.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 인식이 가구 소득, 교육 수준, 주관적 계층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인과응보·권선징악에 대한 믿음은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성별과 연령에서는 차이가 확인됐다. 여성의 동의율(66%)이 남성(60%)을 상회했으며, 18~34세(57%)와 35~54세(58%)에 비해 장년·노년층(71%)에서 더 두드러진다. 종교 여부에 따른 격차도 컸다. 종교를 가진 응답자의 경우 불교(73%), 개신교(71%), 천주교(76%) 모두 비종교인(56%)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유교적 삶을 산다고 응답한 집단(71%)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57%)보다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결국 박연진의 계층에 대한 냉소는 뿌리 깊은 편견을 반영할 뿐, 통계적 사실은 아니다. 인과응보·권선징악은 '없는 사람들'이 버티기 위해 기대는 진통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계층을 막론하고 공유하는 세계관이다. 이러한 믿음은 자신의 행위를 뒤돌아보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타인을 향한 선행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된다.
하지만 이 다수의 믿음은 경계해야 할 점도 존재한다. 타인의 불행을 그저 과거 행위의 결과로 치부하거나, 피해자에게 자업자득이라는 굴레를 씌워 비난하는 논리로 전개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자칫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정당화하는 위험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 결국 인과응보·권선징악에 대한 믿음이 타인을 평가하는 잣대가 아닌 오직 스스로를 향한 성찰의 거울로 남을 때,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끄는 소중한 지혜로 기능할 것이다.
김지범 성균관대 교수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