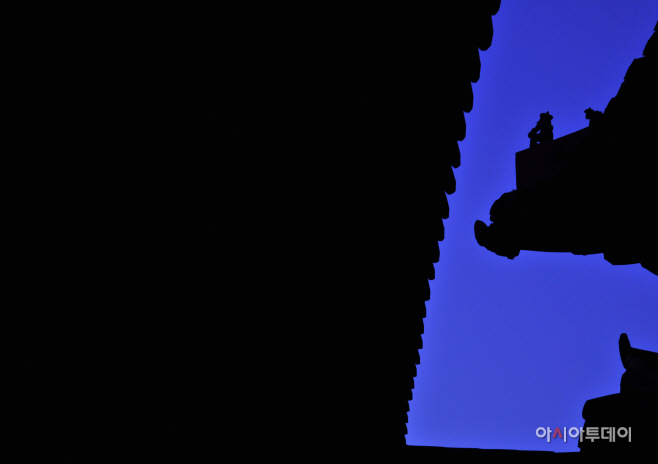|
2. 子規 두견새
聲斷曉岑殘月白 두견새 소리는 이미 봉우리에서 끊겼고 새벽달만 밝은데
血流春谷落花紅 핏빛 물에 떨어져 흘러가는 저 봄꽃 붉기도 하다
天聾尙未聞哀訴 하늘은 귀머거리인 양 아직도 애절한 목소리 듣지 못하고
何奈愁人耳獨聰 어찌하여 수심 많은 사람의 귀만 홀로 밝게 하는가
|
일명 ‘자규子規’로 알려진 단종의 이 시는 세조에 대한 원망과 분노, 그리고 한양에 두고 온 왕비 정순왕후에 대한 그리움을 주로 표현하였다. 특히 단종은 영월로 오기 전 청계천 영도교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던 왕비가 그리울 때면 누각에 올라 피리 소리에 보고픈 마음을 실어 보냈다. 이때 단종은 17세, 정순왕후는 18세의 꽃다운 나이였다.
단종이 영월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정순왕후는 궁궐 밖으로 나와 지금의 서울 낙산 근처에서 초가집을 짓고, 시녀 몇 명과 함께 곤궁한 삶을 살았다. 한양에 홀로 남은 정순왕후는 천을 염색해서 생계를 꾸려 나갔고, 주변의 이웃들은 왕비의 삶이 안타까워 음식을 많이 드렸다. 현재 낙산에는 ‘자주동샘’이라 불리는 작은 샘과 영월을 바라보며 단종의 안위를 걱정했던 ‘동망봉’의 흔적이 남아 있다.
《영조실록》에 따르면 “정순왕후는 궁중의 여인들이 출가하여 머물던 정업원으로 내쫓긴 후 한동안 단종의 죽음을 알지 못했고, 그녀는 매일 아침 정업원 뒷산, 동망봉에 올라 단종이 있는 영월을 바라보며 그리움을 달랬다”라고 기록돼 있다.
이 시는 엄격히 말해 왕비 정순왕후를 그리워하는 내용이 아니라 세조를 향한 원망의 소리이다. 1구에서 보듯이 ‘자규’는 궁궐에서 쫓겨난 자신을 비유한 표현이고, 궁을 향해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해도 귀머거리처럼 듣지 못하는 세조에 대한 분노를 시로 승화시켰다. 그로부터 240여 년이 지난 1681년(숙종 7)이 돼서야 단종은 ‘노산군’에서 ‘노산대군’으로 추봉되었고, 1698년에 묘호가 단종端宗, 능호가 장릉莊陵으로 복원되었다. 글/사진 이태훈. 에디터 박성일기자 rnopark99@as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