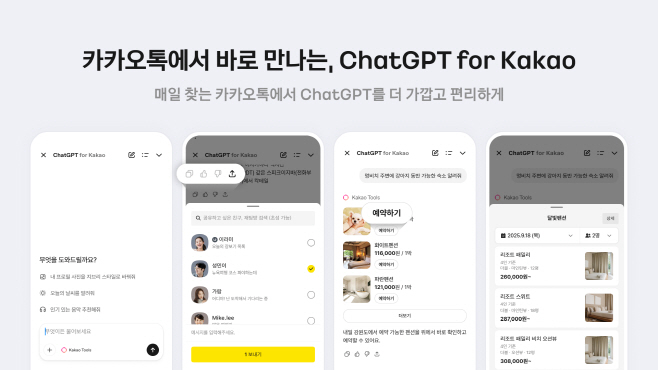|
최근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의 결제 부담 증가는 지정 상환일이 없고, 카드대금 이월에도 연체 없는 리볼빙 서비스 사용을 부추기는 것으로 유추된다.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차주 연소득으로 나눈 지표인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 DSR) 규제 강화도 리볼빙 잔고 증가의 원인이다. 차주별로 적용되는 DSR 규제 대상에 가계의 실수요 대출인 카드론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카드론 규제 강화가 리볼빙 이용 증가란 풍선효과를 불러왔다고 판단된다.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리볼빙 잔고 증가는 가계의 재무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법정 최고금리(20%) 수준에 근접한 높은 리볼빙 수수료율은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을 악화시켜 카드사의 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기간동안 리볼빙 잔고 증가시 고정이하여신액(non-performing loan : NPL)이 증가한 사실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기간중에 리볼빙 잔고가 늘었음에도 카드사의 NPL은 오히려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취약차주의 재무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시행된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조치 때문이다. 해당 조치로 인해 NPL로 분류돼야 하는 대출채권이 연체 채권으로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9월 말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조치가 종료될 경우 잠재적 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 더욱이 낮은 NPL로 인해 카드사의 대손충당금 적립은 그동안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0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 기간동안 카드사의 평균 대손충당금 요적립액 대비 실적립액 비율은 106%였다. 이는 팬데믹 발생 이전 2년 동안 평균인 104%와 비교시 큰 차이가 없다. 이로써 리볼빙 잔고 급증에도 불구하고, 카드사의 재량적 대손충당금 적립은 충분치 않았다고 평가된다.
팬데믹 기간동안 잠재적 신용위험이 증가했음에도 카드사의 재량적 대손충당금이 충분치 않았다는 것은 금년 하반기 카드사가 위험관리에 더욱 주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더욱이 국내 카드사의 대손충당금 적립행태가 이익 규모와 비례해 이루어지는 이익 유연화(income smoothing) 경향을 보인다는 점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결론적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채권 부실 가능성이 높고, 카드론에 대한 차주별 DSR 규제강화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 카드사는 재량적 대손충당금 적립을 늘리는 등 여느 때보다 적극적 위험관리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