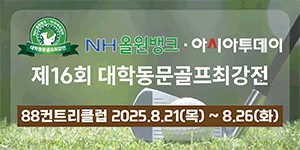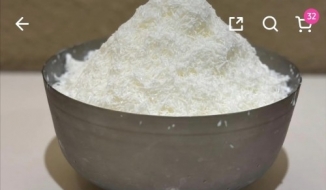|
풍경 둘, 어떤 초로의 어머니가 다소 기괴한 표정의 딸을 품에 안고 목욕을 시키고 있다. 딸은 어린아이라기엔 성년으로 보인다. 얼핏 죽은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마리아의 피에타 상이 연상되는 이 장면은, 보도사진 작가로 유명한 유진 스미스의 대표작 '목욕하는 도모코'라는 작품에 담긴 이미지다. 공장폐수로 방류된 수은에 의해 중독된 채 태어나고 자란, 딸을 목욕시키고 있는 장면이다. 자식에 대한 미안함으로 안쓰럽게 바라보는 어머니의 표정은 아들을 잃은 성모의 마음과 비견된다. '태중의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어미'의 무력함이 고스란히 담긴 이 사진은 세상에 미나마타병의 실체를 알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다음으로, 골조가 드러나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돔, 그 아래 폐허처럼 서 있는 붉은 벽돌의 구조물, 한때 사람들이 숨 쉬던 창문의 흔적만을 간직한 채, 수직으로 버티고 있는 건물의 잔해가 고스란히 보존된 아름다운 공원이 있다. 다소 기괴한 풍광을 품은 이 비현실적인 공간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히로시마 평화 기념 공원'이다. 여기에는 동명의 박물관이 낮고 넓게 펼쳐져 있다. 관람객들은 이곳에 들어서서 나올 때까지 한편의 서사를 경험하게 된다. 원폭이 있었던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일본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목도하게 한다. 무언가 숙연함과 동시에 미안함을 떠안고 나오게 된다. 이 피해자의 공간에 들어선 이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모두 방관자로서 가해자임을 자각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세 번째 풍경이 품고 있는 가공할 만한 이데올로기다. 그렇게 일본은 가해자임을 철저히 외면한 채, 오랜 기간 스스럼없이 피해자로만 자각하고 있다.
처음에 소개한 풍경은 일본 국립 전시관에서 기획한 일본 영토 주권에 관한 전시회의 홍보영상에서 연출된 장면이다. 외국에 영토를 빼앗겨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땅을 어쩌지 못하는 부모 세대의 피해의식과 미안함이 고스란히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너희 세대에 가서는 되찾을 수 있게끔, 잊지 않겠다는 비장함까지 느껴진다. 여기서 잃어버린 땅이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일본인들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다케시마'라고 불리는 섬을 말한다.
두 번째 풍경은 작가의 의지와는 다르게 활용된 측면이 있다. 휴머니스트였던 포토 에세이 작가 유진 스미스는. 미나마타 사건을 취재하던 중에 폐수를 방류한 가해 공장에서 고용한 폭력배들에게 린치당해 척추가 손상되고 한쪽 눈을 실명한다. 그로부터 몇 년 후 그는 후유증으로 고생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된다. 그런데 이 작품은 작가의 의도와는 별개로 교묘한 방식으로 일본의 피해자성을 증폭시키는 데 일조한다. 어딘지 모르게 사진은 세 번째 풍경을 이입하게 한다. 부연하자면 미나마타병 피해자 도모코의 이미지는 외국인으로 하여금 시선을 원폭 피해자와 중첩된 선상에서 돌아보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가해자성은 거세되고 피해자성만을 부각하여, 적어도 서구를 향해선, 일본은 평화를 사랑하다가 피해를 당한 국가로 스스로를 내비쳤다.
다시 첫 번째 풍경으로 돌아와, 일본인들의 상상 속의 존재하는 섬은 우리에겐 주권을 수호해야 할 영토인 독도다. 현실의 공간인 독도는 한민족의 경험과 삶, 애착이 녹아든 장소이자 터전이다. 그런데도 일본이 끊임없이 다케시마를 상상하는 것은 미래의 언젠가 자신들의 땅으로 삼고자하는 일종의 전투적 의지를 다지는 의례다. 그들은 그렇게 의례로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얼마 전에도 일본 정부의 각료들은 전범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했다고 전해진다. 그들은 전범이 아니라 전몰희생자들에 대한 추모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일본의 행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왜 징용문제를 서둘러 매듭지어야 했는지 제대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이황석 문화평론가·한림대 교수(영화영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