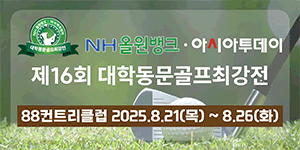|
눈사람을 만들거나 눈썰매를 타는 등 눈은 놀이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우리의 감성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더 특별한 물상이다. 눈이 쏟아져 내리면, 사람들은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고 까닭모를 그리움에 빠져든다. 그리고 쌓인 눈으로 삼라만상이 덮이면, 사람들은 차분하고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 특히 한밤에 함박눈이 내려 쌓인 후 아침에 일어나 새하얀 눈으로 덮인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들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바뀐 경물에 찬탄하며 신선함과 평화로움에 젖어들게 된다. 그때 뜰 안의 나무 우듬지에 까치라도 한 마리 앉아 울면 반가운 손님이라도 올려나 하는 기대감에 부푼다.
한반도에서는 동서의 양 해안지대에서 하늘이 가물가물하게 함박눈이 펑펑 쏟아져서 큰 눈이 많이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게 함박눈이 내려쌓인 새하얀 산야는 겨울의 전형적인 풍광을 연출하게 된다. 조선조 후기의 방랑시인 김삿갓은 산과 그 나무가 눈으로 하얗게 뒤덮인 모습을 ‘만 그루 나무의 푸른 산이 모두 소복을 입었다(萬樹靑山皆被服)’고 묘사했다.
|
눈이 많이 오면 춥고 동해(凍害)도 클 것 같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오히려 ‘눈은 보리의 이불이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눈이 많이 내리면 날씨도 비교적 포근하고 눈이 보리를 덮어 보온 역할을 하므로 오히려 동해가 적고 보리가 더 잘 자라서 보리 풍년이 든다. 그래서 보리와 밀을 많이 심던 과거에는 눈의 보온 효과가 중요했기에 ‘대설에 눈이 많이 오면 풍년이 들고 포근한 겨울을 난다’는 속설이 있었다. 겨울의 많은 눈은 농작물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수분을 공급하고 찬바람을 막아주는 고마운 존재인 것이다.
늦가을에 서리를 맞으면 모든 꽃이 시들어 져버리지만 거의 유일하게 국화만은 서리를 견딘다. 이 때문에 과거에 선비들은 국화를 지칭하여 오상고절(傲霜孤節·서릿발에도 굴하지 않는 외로운 절개)로 불렀다. 그래서 국화는 문인들이 즐겨 그리는 사군자(四君子·고결함이 군자와 같은 네 가지)인 매란국죽(梅蘭菊竹·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의 하나로 꼽힌다. 그런데 국화 품종 가운데에는 ‘한국(寒菊)’이라 부르는 원예 품종이 있는데 이 품종 가운데에는 12~1월에 꽃을 피우는 것도 있다.
대설 무렵부터 본견적인 농한기가 시작되고 이때부터 새해를 맞이할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메주를 띄우는 일이다. 옛날에는 한가해지는 이 무렵에 가정마다 누런 콩을 쑤어 메주를 만들어 띄웠다. 온대성 어류로서 회로 많이 먹는 방어는 산란기 직전인 12월과 1월에 기름기가 많아 이때 가장 맛이 좋다. 그런데 이때는 너무 춥기에 제주도 모슬포 항에서 해마다 개최하는 방어 축제는 입동 끝 무렵 즉 11월 중순 어간에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