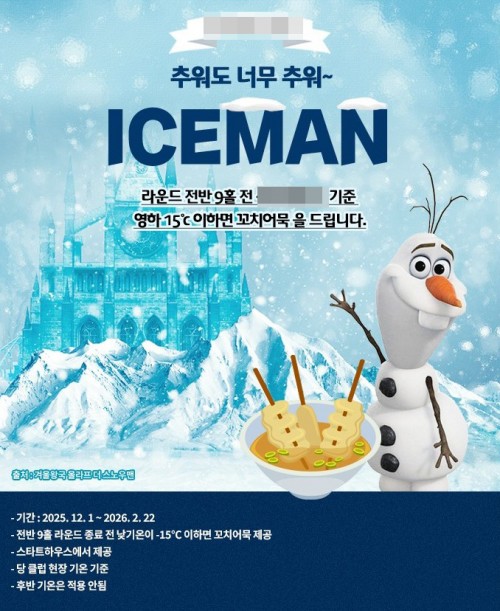|
경실련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올바른 기업구조조정 5대 원칙과 방안 발표’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은 공적자금을 쏟아 붓는 과거의 잘못된 방안을 답습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5대 원칙으로 △경영진의 부실경영 책임 부담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 △실업대책 및 지역 경제 안정화 △한국판 양적완화 불가 △범 구조조정 협의체 구성 등을 제시했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부에서 갑자기 조선·해운업계에 대한 어려움과 구조조정 얘기를 꺼낸 것은 정부의 정책실패가 명확하기 때문”이라며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재정 원칙에서 국회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하려 하는 모습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경영실패 책임은 경영자·대주주·채권자 순으로 진다는 게 원칙”이라며 “지금과 같은 기업구조조정에서는 국민·노동자가 되레 거꾸로 책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국책은행이 부실화되면 국민의 혈세로 자본을 확충해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는 경영실패의 책임을 최소화해 도덕적해이를 일으킨다는 주장이다.
박 교수는 “이러한 폐습을 끊고 새로운 구조조정의 출발을 시작해야 한다는 게 경실련의 입장”이라며 “정부의 공적자금이 필요할 때는 경영자에 대한 문책과 공적자금 투입의 원칙이 분명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나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을 주도하면 (그들의) 인적네트워크에 따라 의견이 반영되고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이 강화될 수 있다”며 “효율적 구조조정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금의 구조조정은 국민혈세로 국책은행을 도와주고, 국책은행은 이 자금을 기업들에 이전시켜 궁극적으로 공기업이나 재벌 총수일가의 실패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한은의 발권력 역시 국가재정투입과 같다”며 “한은을 통한 무분별한 발권력 동원은 외환위기 사태도 불러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실업이 무서워 부실기업에 자금을 지원하지만 정작 실업대책은 하나도 없다”며 “정부가 초점을 맞추고 집중할 것은 실업대책과 지역경제의 안정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권영준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는 “경실련이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재발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구조조정에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서는 잘못된 원칙을 반복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정미화 변호사는 “산업의 구조조정 이슈들이 잠복돼 있고 악화됐는데 정부가 이 문제를 숨겨왔다”며 정부가 공적자금을 수선수단으로 삼아 국책은행에 투입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구조조정 자금이 지원되는 시스템인 기촉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빨리 없애야 한다”며 “회생제도를 적극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근로자와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대타협 논의기구를 만들어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는 선에서 구조조정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정부 주도로 해결을 시도하다 문제가 커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예로 들며 “구조조정은 산업계의 메르스”며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출범시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