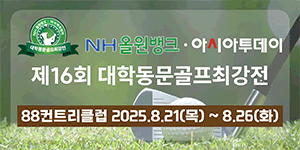|
동남권 투자은행은 부산을 중심으로 해양·산업금융 역할을 수행할 국책은행 형태로 구상되고 있습니다. 부산·울산·경북의 지방정부와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이 함께 약 3조원을 출자해 설립한다는 계획이죠.
이는 전 정부가 추진했던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대안 성격이 짙습니다. 산은 이전은 법 개정이 국회에 계류된 데다, 노조의 강한 반발과 정치적 부담까지 겹치면서 추진 동력을 잃었고, 6월 강석훈 전 산은 회장의 퇴임을 계기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동남권 투자은행을 통해 산은 이전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피하면서, 지역경제 지원을 실현할 수 있는 절충형 방안으로 선택한 셈이죠.
일부에선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산은은 이미 지난해 9월 '남부권 투자금융본부'를 부산에 신설하고, 동남권 투자금융센터 등을 편입해 지역 투자 기능을 확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산은의 조직 권한을 강화하는 편이 효율적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2009년 산업은행 민영화 당시 정부가 별도로 만든 한국정책금융공사 사례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3년 부산 이전을 추진했지만, 기능 중복과 비효율 논란으로 2015년 산은에 통합됐습니다. 동남권 투자은행 역시 구체적인 역할 정립 없이 새 조직만 설립될 경우,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동남권 투자은행이 단지 이름만 바뀐 정책기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행력 있는 설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합니다. 산업은행 등 기존 정책금융기관과의 기능 중복을 피하고, 부산·경남권의 제조업·물류 산업에 특화된 직·간접 투자를 중심 업무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동남권 투자은행이 의사결정과 집행 권한이 실제로 부산 본점에 집중돼야 합니다. 본사는 부산에 두고도 주요 판단이 여전히 중앙부처나 수도권 인사에 의해 이뤄진다면, 지역금융 분권이라는 정책 목표는 형식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동남권 투자은행이 지역 산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금융기관으로 자리 잡고, 갈등 회피성 대안이 아닌 정책금융의 새로운 모범 사례로 안착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