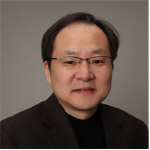|
은유 작가는 '아무튼 인터뷰'에서 지난 20년간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사를 전하며 "그러므로 나는 내가 만난 사람의 총합"이라고 말한다. 삶의 여정에서 수많은 사람과 함께 웃고 떠들고, 때로는 투덜대고 고민을 나누고, 서로를 지탱해 왔다. 그렇게 쌓인 관계와 흔적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지금은 각자의 사정으로 '시절인연'으로 끝난 이들도 있지만 몇몇은 여전히 친구로 남아있다. 그들과 속사정을 털어놓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경험을 나누면서 소속감을 느끼고 자신을 더 알아가게 된다. 돌아보면 어린 시절엔 "인생에 진짜 친구 세 명만 있으면 성공한 삶"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그럴 때마다, 절친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소리인가 싶었다. 그러나 문득 묻게 된다. 과연 지금의 나는 몇 명의 절친이 있을까?
절친을 세어보며 왜 내가 그들을 절친이라 부르는지, 다시 말해 나에게 절친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묻게 된다. 사람마다 정의는 다르겠지만, 오랜 세월 이어진 관계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상처가 될 말을 삼가며,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쌓인 사이가 바로 절친 아닐까. 연락이 오면 나도 몰래 미소가 지어지고, 만남이 기다려지는 그런 관계-절친은 신뢰의 결정체다.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에서 한국종합사회조사(KGSS)를 통해 2021년, 2023년, 2025년에 18세 이상 전국 성인을 대상으로 "귀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끝까지 믿어주는 친구가 몇 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 문항에 답하지 않은 4%를 제외하면, 국민 4%는 절친이 0명, 12%는 1명, 31%는 2명, 29%는 3명, 8%는 4명, 11%는 5명, 그리고 5%는 6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즉, 대한민국 성인 96%는 자신을 끝까지 믿어주는 절친이 최소 한 명 이상 있다고 느낀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과 비교하여 고연령층에서는 절친의 수가 줄어든다. 청년층(18~34세)의 65%가 절친이 3명 이상이라고 답했지만, 고령층(65~74세)은 48%, 초고령층(75세 이상)은 35%로 감소했다. 다만, 중년층(45~54세)과 준고령층(55~64세)에서도 절반가량이 3명 이상의 절친을 유지하고 있다. 절친이 한 명도 없다고 답한 사람은 노년층 이전에는 3% 이하에 불과하지만, 노년층에서는 7%, 초고령층에서는 22%로 크게 증가한다. 절친이 없거나 1명에 불과하다고 답한 사람은 노년층의 경우에는 20%, 초고령층의 경우에는 무려 39%에 이른다.
절친의 숫자 뒤에는 관계의 역동성과 세월의 결이 묻어있다. 절친은 대체로 동년배로 오랜 세월에 걸쳐 쌓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 처음에는 단순한 지인으로 시작하지만, 우연한 계기나 꾸준한 만남을 통해 서로의 태도와 가치관, 속마음을 드러내며 이심전심으로 친구로 발전한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모든 친구가 절친이 되진 않는다. 친구에서 절친이 되었다가 다시 친구로 돌아가기도 하고, 절친이라 믿었던 관계가 어느새 친구도 아닌 사이로 멀어지기도 한다.
절친이 꼭 죽마고우일 필요는 없다. 동년배가 아니어도 된다. 사회정서적 선택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인식이 커질수록,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선택하고,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한다. 이에 따라 노년에는 폭넓은 교제보다 마음이 통하는 몇몇 관계에 집중하게 된다. 이 이론은 노년기의 관계 축소가 왜 일어나는지를 설명하지만, 인간관계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새롭게 형성되고 변화한다는 점은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 현재의 절친만을 붙들기에는 노년의 20년은 결코 짧지 않다. 장수의 시대를 맞아, 우리는 질병이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건강한 노년을 위해 영양제를 챙기고 운동에 힘쓴다. 그러나 친구, 특히 절친이 주는 신체적·정신적 혜택의 가치는 종종 잊고 산다. 사회가 정한 노인의 나이에 주눅 들지 말고, 새로운 절친을 만드는 일에 주저하지 말자. 절친 없는 노년은 삭막하다. 인생은 여전히 또 다른 절친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다.
김지범 교수는…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학사, 시카고대학교 사회학 석·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부임 전 10년간 미국 시카고대학 NORC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세계여론조사학회 아시아 퍼시픽 회장을 역임했고, 2014년부터 서베이리서치 센터장으로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의 책임연구자를 맡고 있다.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김지범 성균관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