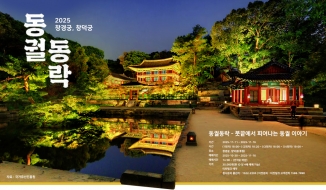내년까지 안벽크레인 완전자동화
"정부·민간·노조 합의해 자동화로"
신항과 함께 부산항 중요 축 기능
|
지난달 30일 보안으로 인해 엄격한 신분 확인 후 들어선 BPT는 한눈에 다 담기지 않을 만큼 크고 복잡했다. 액션영화에서 흔히 봤던 부두와 거대한 컨테이너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컨테이너를 실은 트럭들은 쉴 새 없이 이동하며 경고음을 울려댔다. 크레인 역시 컨테이너를 일렬로 접안된 선박에서 육지로, 육지에서 선박으로 실어 날랐다.
BPT는 사실 부산항에서 가장 먼저 자동화를 시작한 곳이다. 2006년 신항보다 앞서 자동화 야드 크레인을 도입했고, 이 경험이 신항의 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기반이 됐다. '오래된 항만'이지만 이미 그때부터 최신화 준비가 돼 있었던 셈이다.
신선대에는 안벽 장비인 겐트리크레인(안벽크레인) 16기, 간만부두에는 8기가 설치돼 있다. 두 터미널은 내년부터 안벽크레인 자동화를 본격화한다. 신선대에선 내년이면 안벽크레인 자동화 100%를 완료할 예정이다. 11월 시범 개조를 시작으로 장비의 상업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 간만에서는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자동화 전환을 추진한다.
|
야드크레인의 자동화도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존 장비 8대를 개조하고 새로 7대를 들여와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이다.
한 실장은 "운영사는 안전과 효율을 위해 자동화를 추구하지만 노조 등이 있어 혼자 나서서 할 순 없다"며 "정부·민간·노조가 함께 협의해 자동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신항이 세계 주요 선사 중심으로 대형화와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면, 북항은 국적선사 중심의 거점 기능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북항 기항 선박의 90% 이상이 국적선사이며, 수출입 물량 대부분이 이곳을 거친다. 북항은 여전히 부산항의 중요한 축으로 기능하는 셈이다.
수십년의 세월을 거친 오래된 터미널이지만, 규모는 국내 여타 터미널 이상이다. BPT에선 연간 400만TEU의 물동량을 처리한다. 인천항은 330만TEU, 광양항은 280만TEU다. 북항 전체를 따지면 부산항물동량의 약 25%를 책임진다.
한 실장은 "신항과 북항은 투포트화돼 각각 기능적인 부분이 다르다"며 "북항이 없어지면 신항의 운영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국가 물량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두 곳은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행 BPT 대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부산항의 역사와 함께하며, 대한민국 해운항만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재)바다의품과 (사)한국해양기자협회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