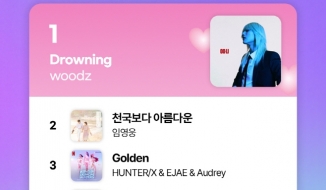|
그러나 금년 5월 20일 의회에 보고된 ‘중국인민공화국(PRC)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이라는 행정부의 문건은 “중국 공산당의 의도와 행위에 대한 명석한 평가에 기초하여, 중국에 대한 경쟁적 접근을 채택했다”고 밝힘으로써 중국 공산당이 대결의 대상임을 암시했다. 이 문건은 또 “미국은 중국인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고 중국과 오랜 유대를 즐긴다”고 말함으로써, 그리고 시진핑을 종전대로 국가 “주석”이 아니라 공산당 “총서기”라고 지칭함으로써, 중국 및 중국인을 중공과 구분하고 있다.
이후 미 행정부의 주요 수장들이 역할 분담으로 공조한 연설들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과 공산 정부의 이념과 행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6월 24일에는 오브라이언 안보 보좌관이 중국 공산당의 이데올로기에 관해서, 7월 13일에는 레이 FBI 국장이 중공의 스파이 행위에 관해서, 7월 16일에는 바르 법무장관이 중공의 불법적, 탈법적 산업활동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7월 23일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중공과 자유세계의 미래’라는 포괄적 제목으로 중공에 대한 미국과 자유세계의 자세에 관해서, 연설을 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연설은,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견제의 대상을 ‘중공’으로 분명히 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중공은 새로운 폭군으로서 안으로는 점점 더 권위주의적이고 밖으로는 자유에 대한 적대감에서 더욱더 공격적이며, 거의 언제나 거짓말을 하므로 그들의 말은 불신하고 검증해야 하며, 말은 많지만 행동은 변하지 않아 진실로 중공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그 지도자들의 말이 아니라 행위에 기초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폼페이오는 또 중공과 중국인을 분명하게 분리하였다. 그는 중공이 권력을 잃는 것 다음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인민들의 정직한 의견이라며 중공에 반하여 역동적이고 자유를 사랑하는 중국인들을 포용하고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중공의 변화를 중국 인민에게만 맡겨 놓을 수 없으며 자유세계가 함께해야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소련과는 달리 중국은 이미 세계 경제와 깊이 얽혀 있어 중공의 변화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미국의 대중국 의존보다 중국의 대미국 의존이 더 크므로 자유세계가 단합하여 행동하면 중공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중국은, 무역과 산업과 외교와 군사 등 미국의 전방위적 견제에다가 홍수와 흉작과 저성장이라는 내우외환(內憂外患)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 게다가 코비드-19와 홍콩 보안법을 계기로 점점 더 많은 서방 국가들이 미국과 행동을 같이 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일방적인 구단선(九段線)에 의한 남중국해 90%의 영해화, 동경 124도를 경계로 한 서해 72%의 임의적 영해화, 많은 나라들과의 국경 분쟁, 갈등을 빚는 나라들을 거칠게 몰아붙이는 이른바 ‘전랑외교(戰狼外交)’ 등으로 고립을 자초해왔다. 그러다 보니 중공 내부에서조차 “중국이 미국에게 얻어맞는데도 중국에 동정을 표하거나 지지하는 나라가 없다”는 한탄이 나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수렁에 너무 깊이 빠진 데다 자신의 존망이 걸린 문제여서 중공은 물러설 수도 없다.
미국의 중국 견제는 자유세계와 중공과의 체제 싸움이라는 새로운 냉전이 되어가고 있다. 그에 따라 미중 갈등에서 취해온 우리의 ‘전략적 침묵’은 점점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