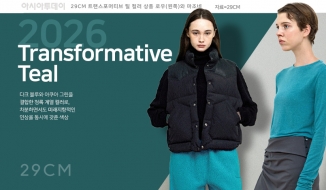고가 주변은 갈치 속처럼 비리고 애잔한 것들 천지다. 이곳의 노포들은 각자의 세월과 맛을 함께 버무려 상에 올린다. 어느 육칼집은 무의 개운함과 파의 칼칼함을 동시에 느끼기 참 좋다. 점심시간만 되면 기사들로 빼곡히 들어차는 돈가스집은 어린 시절 어머니의 손을 잡고 들어간 경양식집 맛을 낸다. 나이프에 묻은 소스를 혀로 핥으면 왠지 어머니의 잔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고가를 건너면 잡내 잘 잡는 내장탕집이 건너편에 있고 대구탕 골목도 그 근처다. 이곳은 행인과 함께 시간을 멈춰 세운다.
이제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 한강로에 진입하면 곧 용산역이다. 몸으로 생을 사는 여성과 돈으로 성을 사는 남성이 한때 이곳에서 섞였다. 사는 것과 사는 것은 그만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거래의 제안과 성사 과정은 근처를 배회하던 중년 여성의 언변에 달렸다. 그녀는 당장 스쳐 가는 풋내기를 붙잡고 왜 지금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뽑아와야 하는지 설득할 자신이 있다. 둥지 위 제비 새끼 입에 먹이를 물려주듯, 그녀들은 부지런히 날며 남자를 물어다 주었다. 너저분한 삶들이 고여 든 구정물 위에도 가을에는 낙엽이 내릴 줄 알았다.
길 건너에는 희고 번듯한 건물이 한 채 서 있다. 오래전 이 건물은 국제빌딩이라 불렸다.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다. 그러나 그 건물의 내력은 아무도 바꾸지 못한다. 신군부 정권이 들어선 1980년대에, 전두환은 이 건물의 주인이었던 국제그룹을 해체하고 만다. 국책 기관을 위한 청와대의 모금 요청에 너무도 적은 액수를 기부했다는 게 이유라고 했다. 회장 양정모는 제 기업을 돌려받지 못하고 2009년에 숨졌다. 전두환은 아직 살아 숨 쉬고 있다. 징벌적 죽음의 발생은 늘 역순이었다.
이 길이 가진 아픔의 끝은 용산 참사 현장에 걸쳐 있다. 돈을 내세운 재개발 조합에 돈에 내몰린 철거민이 맞섰다. 돈을 좇은 전철연이 가세했고 남일당 건물을 점거한 그들은 망루 위에서 화염병을 던졌다. 낮게 깔린 시너의 유증기는 돈이 아닌 불에 반응했다. 하필 경찰은 진압 작전에 돌입한 터였다. 2009년의 어느 겨울날, 전철연 3명과 철거민 2명, 경찰관 1명이 불에 타 숨졌다. 비극적 죽음의 배분은 늘 이득순이었다.
아, 이제 나는 이 아픔의 길에서 그만 벗어나고 싶다. 한강대교 북단쯤에서 나는 그러했던 과거와 이별할 수 있었다. 뒤를 돌아보았다. 퇴근길 러시에 갇힌 차들이 길게 꼬리를 물었다. 그 많은 억압과 순응이, 작용과 반작용이, 진리와 모순이, 생사가 관통하는 한강로 위에 점멸하고 있다. 집창촌이 있던 자리에 더센트럴이라는 기념비가 솟았고 남일당에는 파크타워라는 위령탑이 솟았다. 국제빌딩은 이제 LS의 것이다. 다 그렇게 지나가며 잊히리라.
이 글을 통해 무언가를 주장하거나 관철할 생각은 없다. 그저 내가 기억하는 한강로 엘레지를 들려주고 싶었다. 이 글 또한 그렇게 잊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