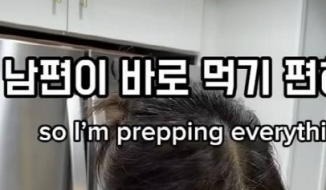노후 하수관 누수 사고원인 지목
市 '위험지역 지도' 공개 소극적
|
지난 23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로 대피한 주민 최막균씨(65)는 한숨을 쉬며 임시 거처로 사용 중인 호텔로 발걸음을 옮겼다. 사고 이후 밤새 복구 작업이 진행됐지만 24일 오전까지도 현장은 여전히 분주했다. 골목 안쪽 빌라에 거주하던 최씨는 "한순간에 내쫓겨서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른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다"고 토로했다.
구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23일 오후 7시 33분께 이문2동 복합청사 부설주차장 공사장 인근 골목에서 깊이 2.5m, 넓이 13㎡ 규모의 땅꺼짐이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건물이 기울면서 내부에 있던 인부 1명이 구조됐다. 주민 35명도 인근 숙박시설로 긴급 대피했다.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노후 하수관의 누수가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9시 30분께 해당 장소에서 미세한 지반침하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복구 작업이 이뤄졌다. 복구는 오후 6시께 마무리됐지만, 이후에도 길바닥 틈으로 상수도 물이 새나왔고, 곧이어 다시 땅이 꺼졌다. 공사 관계자는 "며칠 사이 비가 많이 내려 수압이 올라가면서 지면이 약해졌다"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서울시 내 땅꺼짐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폭우까지 겹치며 시민들의 '발밑 공포'가 커지고 있다. 장마철에는 갑자기 불어난 지하수로 하수관이 파손돼 누수가 생기기 쉽고, 이는 지반 약화로 이어진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발생한 지반침하는 총 72건이다. 이 가운데 5월 집중호우 기간에만 44건이 발생해 전체의 60%를 넘는다.
특히 서울은 노후 하수관이 많아 지반침하에 더욱 취약하다. 2023년 12월 기준 서울 하수관 1만866㎞ 가운데 30년 이상 된 하수관은 6082㎞로, 절반이 넘는다. 서울시는 매년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간 100㎞씩 정비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 계산으로도 전면 정비까지는 수십년이 걸린다.
동대문구의 한 주민은 "여기 땅이 약하니까 꺼진 것 아니냐"며 "근처 사람들이 밤새 한숨도 못 잤다고 들었는데, 나도 언제 집에서 뛰쳐나와야 할지 몰라 불안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땅꺼짐 위험 지역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는 데 소극적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싱크홀이 발생한 직후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제작했지만, 일반 시민에게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어 올해 3월 강동구 명일동에서 1명이 숨진 사고 이후 '지반 특성 반영 지도' 제작에 착수했지만 지도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주민 불안과 특정 지역에 대한 낙인 우려가 이유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용역 입찰을 마치고 착수하는 단계이며, 공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