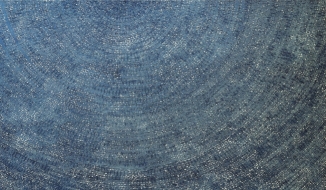지방은행도 지역 대학과 플랫폼 구축 협력 강화
미래 고객 대학생 선점 목적…은행·대학 '윈-윈' 효과
|
캠퍼스 플랫폼은 일정 조회, 학사 행정 관리 등 대학생의 일상과 맞닿은 생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접점 확대에 유리하다. 특히 주거래은행이 아니더라도 대학 단위로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어, 미래 고객 확보를 위한 전략적 기회로도 평가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지난 3일 호서대학교와 '스마트캠퍼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스마트캠퍼스는 학사관리 시스템과 연계해 출결 관리, 커뮤니티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 플랫폼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5월부터 플랫폼 개발을 추진해왔다. 이달부터 호서대를 시작으로 타 대학으로 협약을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식단표 조회, 기숙사 신청 등 다양한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이 가장 적극적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2022년 금융권 최초로 대학생 전용 플랫폼 '헤이영캠퍼스'를 론칭했다. 각 대학 학사 시스템과의 원활한 연동, 용돈줍줍·반값점심 등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를 내세워 빠르게 성장했다. 플랫폼 적용 대학은 2023년 상반기 21곳에서 올해 상반기 101곳으로 2년 만에 5배 가까이 늘었고, 하반기에도 추가로 30여곳 대학에서 플랫폼을 오픈한다.
지방은행들도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BNK부산은행이 작년 9월 출시한 '캠퍼스락'은 지난해 대동대학교, 동아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각각 작년 2학기, 올해 1학기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iM뱅크의 'iM유니즈'도 올해 경북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캠퍼스 플랫폼은 당장 은행에 직접적인 수익을 가져다주진 않는다. 그럼에도 은행들이 속속 플랫폼 구축에 뛰어드는 이유는 미래 고객인 대학생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대학과 연계한 행사·이벤트를 플랫폼을 통해 꾸준히 노출해 접점을 넓히고, 이들을 자사 금융 서비스에 끌어들여 장기 고객으로 유치하는 '락인 효과'를 노린 것이다.
특히 플랫폼 협약은 대학의 기존 주거래은행 계약과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주거래 협약을 맺지 않은 대학에도 서비스를 확산할 수 있고, 대학은 시스템 구축·유지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학생들의 디지털 편의성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청년층은 단순히 금리나 조건보다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보고 주거래 은행을 정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플랫폼 운영을 통한 잠재 고객 확보가 주거래 협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