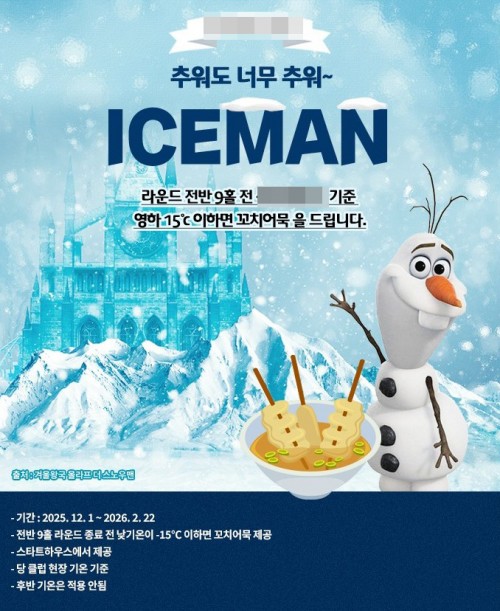|
김성일 한국아웃플레이스먼트연구소 대표<사진>는 베이비붐 세대의 전직 및 조기 재취업을 위한 기업의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강화 흐름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고용노동부에 7년 이상 몸담고, 전직지원사업의 메카인 노사발전재단의 전직지원센터, 국내 최초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실시한 DBM코리아에 근무하는 등 전직지원서비스 사업에 있어 민관영역을 두루 섭렵한 전문가다.
김 대표는 “지난해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후 근로자들의 퇴직관리까지 기업이 책임을 지는 등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에 있어 기업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은 일정규모(300인) 이상의 사업주에게 정년퇴직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취업·창업교육 등의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대표는 “이 같은 흐름에 따라 대기업들도 인사팀에서 퇴직자 교육, 퇴직자 행정지원 등을 담당하는 퇴직관리팀을 분사하는 등 자체적으로 근로자의 퇴직관리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현재 기업들이 전직지원서비스를 '인력조정의 윤활유'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까지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견될 경우 노조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직지원서비스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직지원서비스의 순기능 차원에서 접근하는 기업은 10%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기업들의 일시적이고 폐쇄적인 전직지원서비스 제공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아직 대부분의 기업들은 구조조정이 발생한 후 일시적 형태로 진행하는 등 사후대응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기업 82개사 중 19.8%의 기업만이 상시적인 전직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김 대표는 상시적인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해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들이 퇴직 후의 삶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퇴직관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로 전직과 창업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년근로자의 경우 전직에 있어서 경제적 요소만을 고려할 수 없다”면서 “생애관점에서 퇴직 이후의 삶을 미리 계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