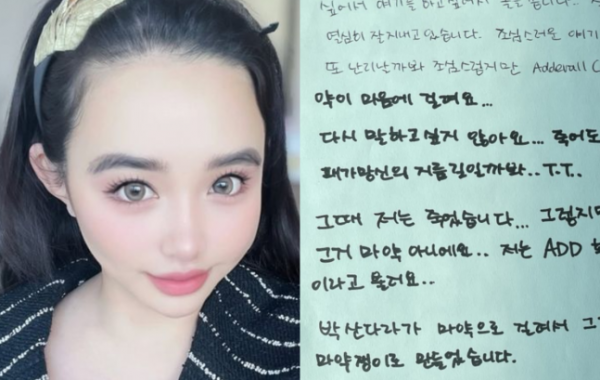|
뇌물수수 사건이나 불법 정치자금 사건은 공여자 진술에 입증의 상당 부분을 의존한다. 대부분 현금거래로 이뤄지는 데다 돈을 받았다는 사람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사망했고, 돈을 전달했다는 시기도 8∼9년 전이어서 물증이 남아있길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 때문에 돈 전달에 관여했을 성 전 회장의 측근을 확보하는 것이 검찰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인터뷰에서 “내가 직접 줬지요. 거기까지 가는 사람은 심부름한 사람은 우리 직원들이고요”라고 밝혔다.
금품 제공에 심부름을 한 사람이 실제로 존재할 경우 검찰에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도 있다.
성 전 회장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지 1장과 인터뷰가 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유언처럼 읽히기 때문이다.
성 전 회장과 심부름꾼 주변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해 의미 있는 뭉칫돈의 흐름을 확보한다면 유품으로 발견된 메모 등과 함께 유력한 정황증거로 삼을 수 있다.
지난해 강서 재력가 살인교사 사건의 경우에도 검찰은 살해당한 송모씨가 생전 남긴 ‘매일기록부’를 토대로 금품로비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성 전 회장이 2002년 5∼6월 자유민주연합에 불법 정치자금 16억원을 전달할 때도 측근이 관여한 바 있다.
성 전 회장은 당시 대아건설 회장이자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의 특보로 재직하면서 2004년 17대 총선을 준비 중이었다. 그는 ‘지방선거 자금 30억원을 지원해달라’는 김 전 총재의 부탁을 받고 대아건설 경리이사 전모씨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전씨는 성 전 회장의 지시로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 16억원을 조성하고 자민련 중앙당 후원회에 기부했다. 돈은 대아건설 지하주차장에서 전씨가 자민련 사무부총장에게 직접 줬다.
성 전 회장과 전씨는 법인 후원금 한도를 넘는 거액의 정치자금을 건네려고 하도급업체 8곳 명의로 후원하는 것처럼 꾸몄다가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성 전 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심부름꾼 전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