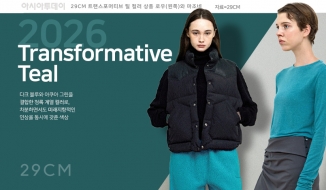감사의견 2년 간 비적정 땐 즉시 상폐
투자자 "회계 투명성 높여야" 지적도
|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장폐지가 최종 결정된 기업은 50곳이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39개, 2023년 28개였던 것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는 정부의 자본시장 구조 개편과 맞물려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감사의견 미달 기업에 대한 퇴출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감사의견이 2년 연속 비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으로 나올 경우, 개선기간 없이 즉시 상장폐지되는 점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나올 때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돼 심사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지만, 이번 개편으로 퇴출 속도가 빨라졌다.
50개 기업 중 감사의견 거절로 퇴출 대상이 된 곳은 5개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감사의견 거절이 단순한 회계 오류가 아니라 회계 투명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투자자 손실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빠른 퇴출이 오히려 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최근 상폐 위기에 놓인 대동전자의 경우, 홍콩 소재 관계기업에 투자한 268억원의 금액이 회수 가능한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감사인으로부터 2년 연속 한정의견을 받았다. 이에 거래소는 즉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으나 대동전자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기업도 늘고 있지만, 실제 인용되는 사례는 드물다. 법원에서 대부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소의 상폐 결정이 번복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동전자는 이미 거래소가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이행여부까지 심의한 이후 상폐가 결정된 곳이다. 개선계획을 심사하면서 이행 능력이 없거나 이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상폐 통지를 받은 기업들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케이스는 꽤 많다"면서도 "최근 동향을 보면 인용 여부 결과까지 시간이 꽤 걸리고 상폐를 중지하라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상장기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장폐지 제도가 엄격해지며 부실 기업의 퇴출 속도는 빨라졌지만, 여전히 투자자 보호 장치엔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투자자들은 감사보고서 확인 외에 기업의 실질적 경영 상태를 점검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는 감사의견 미달은 단순한 회계 이슈가 아니라 기업의 존속 가능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신호라고 설명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일부 기업이 주요 거래 내역, 자산 평가, 내부 통제 등에서 고의적으로 회계상 오류를 발생시켜 감사인이 이를 적발하는 것"이면서 "반복적인 비적정 의견 기업은 유예 없이 즉시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 의견이 '한정', '부적정' 등으로 바뀌는 기업에 대해 실시간으로 공시하는 등 투자자 경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투명한 공시를 위해 감사인의 책임과 회계 감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